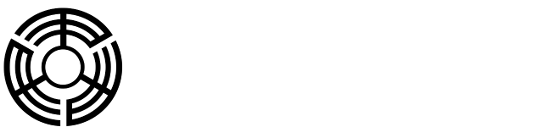태사공(太師公) 심묘사적(尋墓事蹟)
공의 묘소는 경주 기계현 벌치동(現 포항시 기계면 봉계동) 구봉산 아래에 장례를 모셨고, 묘 앞에 표석을 세웠었는데 조선조 중엽 어느 때에 경주의 토호 품관인 이하지라는 자가 묘소의 표석을 부러뜨려 땅에 묻고 투장(몰래 묘를 쓴 것)하였다. 그 후 후손들이 공의 묘소를 찾았으나 거기에는 딴 사람의 묘로 봉분이 변하여 있었으므로 알 길이 없었다. 그러던 중 경주에 거주하던 후손 윤숙이 공의 묘소를 일찍이 짐작하던터이라 숙종 45년 己亥(1719) 정월에 서울에 올라가 종중 제족에게 이 사실을 호소하였다. 서울에 있던 후손들로서 당시 영부사 윤지완, 참판 윤헌주, 승지 윤봉조, 사부 윤봉구, 직장 윤봉휘, 광주부윤 윤양래, 도사 윤사훈, 전판부사 윤지선, 한림 윤세주, 이조좌랑 윤선, 현감 윤이풍등, 요로에 계신 분들이 종중에 통문을 발송하여 종회를 열고 협의한 끝에 종중사인 정로를 경주에 내려보내여 경주부윤에게 소청을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동리의 리임(理任)등과 결탁하여 붙잡아 가두고 그 입을 봉하고자 죽여 없애려는 악랄한 흉계까지 꾸몄고, 경주 부윤도 “오래된 일이어서 알 수 없는 일이니 무슨 증거가 있느냐?”고 들어주지 않을뿐더러 도리어 공갈과 위협으로 대하고 부당한 곤욕으로 이 정당한 청원에 대한 처리를 고의로 회피하는 것이었다. 태사공으로 말하면 고려의 건국공신이시고 그 후손으로 국구(임금의 장인) 성모(왕비)가 여러분 계셨고, 명상현신들이 많을 뿐 아니라 그 후손의 수효만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거족이거늘 먼 시골의 일개 품관 따위의 농간으로 수령의 지위에 있는 자까지도 이에 동조하였다 함은 실로 한심스럽고 통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의 제종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숙의한 후 각종 전기, 보책 등 사료를 수집하였으나 확적한 증거될 만한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심증으로만 공의 묘소가 과연 어디라는 것만 내걸고 계속하여 찾아내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을 뿐이다. 그 후 후손 이(理)가 경주 부윤이 되어서 현지에 가서 물적 증거를 찾았으나 얻지 못하였다. 영조 13년 정사(1737)년에 후손 봉정이 본부영장이 된 후에 그곳 토민들의 가리킴을 듣고 “태사공 묘소가 곧 여기라”고 지목되는 묘 아래 바로 밑을 파헤쳐 본 즉 과연 깨어진 비석 한 조각에 양각으로 각자(刻字)된 대부윤이라는 큰 글자인 세 자를 얻었다. 비로소 종인들은 기쁨에 넘쳐 묘소를 찾아내는 희망을 걸게 되었다. 이와 함께 소위 이가 양반이란 자들을 문초하여 자백을 얻은 후 세사람을 옥에 가두고 엄하게 다스렸다. 기미(1739)에 이(理)의 아들 익헌공 양래가 본도 감사에 도임한 후, 부근 일대의 좌우 양쪽을 파헤쳐 또다시 선지금강이라는 넉자의 작은 음기로 된 돌조각을 얻음으로써 더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되었으니, 선지는 태사공의 아들 삼한벽상공신이시고, 금강은 공의 손자 휘(諱)인 까닭이다. 이리하여 이 사실을 종회에 통고하는 동시에 성금을 모아 경신년(1740)에 묘표를 세우고 당시 후손 중 재산가들로서 제전을 마련하여 분묘를 다시금 모셔 수호하기에 이른 것이다. 신미(1751)년에 후손 지돈녕 광소가 안동 부사였을 때 묘암을 창건하고, 재실을 묘 좌편에 짓고, 제기의물을 마련하고, 중을 두어 수호케 하였다. 후손 판서 방이 본부에 도임해서 더 확장하여 모두 40여 간이나 되게 하였다. 그 후 임신(1752)년에 정승 동도공이 본도 감사였을 때 제전 한섬 30두락을 마련하였다. 그 후 후손 광안과 성대가 또한 본도 감사와 동래부사가 되어 묘사를 다시 중수하고 제전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후손들로서 재산가나 각 고을 수령인 분들에게 돈과 곡식 지물 등을 거출케 하여 전답을 늘리고 문권을 작성하며 본부에서 수호하여 받드는 방도를 만들어 비로소 만전을 기하게 하였다. 그 후에 묘소 2리 근처에 봉강 서원을 창건하고 공을 향사하여 본부에서 봄가을로 제전을 드리게 하였는데, 그 후 고종 5년 무진(1868)년에 대원군에 의한 서원 페지로 철원케 됨에 후손 울선이 제전 168두락을 바쳤고 원답은 재소에 환속시켰다. 배위(配位)의 묘소는 경주 남면 봉동산 아래 박달리에 감용 좌좌오향 득수진파 동서분으로 모셨고, 비석을 묘 아래에 묻었다고 전하나 태사공과 합폄되셨다는 기록도 보인다. 그런데 한 가지 아름다운 사실은 후손 동도가 본 고을 감사 재임 당시, 재실을 창건하는데 대들보 등으로 쓸 재목이 마땅치 않았는데 마침 경주 고척박씨 문중 선영이 구천면에 있어 큰 재목이 있으므로 그 중 40여 주를 무상으로 기부를 받아쓰게 된 사실로서 그들 박씨문중과는 상부상조한 잊지 못할 정의를 맺게 하였다. 태사공의 묘소에는 묘표와 묘지가 있는데 묘표는 25대손 이조판서 혜교가 지으시고 25대손 경주부윤 휘정이 쓰셨으며, 묘지는 공의 사적과 탄생에 대한 설화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30대손 가선대부 이조참판폄 홍문관 부제학 태준이 쓰셨다. 지난 1971년 가을에 후손 귀보가 단독으로 성재를 내어 신도비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