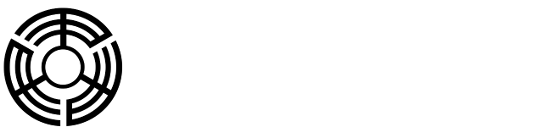심묘사적
심묘사적 (尋墓事蹟: 묘를 찾은 경위)
여지승람(與地勝覽)에 파주 분수원 북쪽에 윤모공의 묘소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옛 족보에 파주 분수원 문숙공 묘소가 있으며 문숙공묘도 동원(同原)에 있다고 하였다. 공의 묘 앞에 교자총이 있고 청룡(靑龍)밖에 전마총(戰馬塚)이 있다고 쓰여 있다. 그런데 이조에 내려와서 연산조 때 양주, 파주, 고양 등 세 고을이 왕의 사냥하는 유행소(遊幸所)로 정해지고 일반 민간인의 출입을 금하여 봉쇄지구로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종파가 한때 미약하여 수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병화가 겹쳐서 후손들도 돌볼 기회가 적었다. 이러한 틈을 타서 정승 심지원이 그의 할아버지 묘를 써놓고 그 후 이어서 수개의 묘를 썼지만 자손들이 선조의 묘소가 어찌 되었는지 모르고 지내기를 수세(數世)에 걸치었다.
영조 23년(서기 1747년)에 후손 동규(東奎)가 그 아들 광로(光魯)와 함께 혼사로 장단 땅에 가다가 마침, 그 지역을 지나는 길에 분수원에 이르러 선조의 유영(遺塋)을 잃고 있음을 느끼고 산 위에서 방황할 때 홀연히 본즉 심지원 묘의 청룡 위에 다시 사초를 한 위, 아래에 묘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모두 짧은 비를 세웠으되 위에는「宣略將軍李好文墓(선략장군이호문묘)」라 쓰여 있고, 아래는 「執義德水李謨墓(집의덕수이모묘)」라고 되어 있으며, 심가의 큰 무덤에는 전부터 비석이 없는 모양이었다. 몇 해 후 다시 산 위를 올라가 본즉 심가 묘아래 큰 무덤이 있으되 분묘의 형상이 깎여져 있고 옛 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 본즉 이호문의 비석이었다. 그런데 그 곳 지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심가 묘아래 큰 무덤은 즉 윤시중 묘이고, 옛날에는 묘 앞에 돌사람과 비가 있었고, 굽은 담장으로 된 묘지(墓地)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심가가 여기에 투장(偸葬)을 해놓은 후에 비석 같은 일체의 흔적을 없애 버렸으니, 자손들이 찾으려 해도 찾을 도리가 없고 또한, 근 백년을 그대로 내려 왔은즉 충분한 증거조차 없어 공의 묘소는 잃어버리고야 말 처지에 있어, 자손들도 어떻게 확실한 증거를 잡아내야 할지 고심하던 처지에 있던 때였다. 이에, 그 부자가 곧 산에서 내려와서 모든 종족들과 의논하여 유영 찾을 방도를 연구하게 되었다. 우선 이호문의 손자 형진을 붙잡아다가 힐문한즉 심가가 이가를 매수하여, 상광(上壙)의 이호문 묘라는 것은 허광이요, 아래편이 전광으로서 심가의 변형 묘로서 공의 묘소 상관을 덮쳐 침범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의 묘비를 없애 버리어 흔적 없애려는 모계로서 이호문의 후손들에게 제토를 주어 제사케 하였던 것이다. 교자총이라 함은, 문숙공께서 북정(北征)하실 때 타시던 교자를 이에 묻은 것을 말함이다. 후손 좌윤 면교(勉敎)가 제종의 선두에 서서 왕께 이 연유로써 상소를 하였고, 계속해서 좌상 동도(東度)께서 왕께 아뢰니 영조 대왕께서도 그 간사한 형편을 살피시나 다만 확증될만한 비문이 없고 또한 오랜 세월을 경과하였기 때문에 이가의 비를 빼어 버리는 것만을 명하고, 양가에서 각기 수호하라는 명령이 계시었으니, 자손 된 자들로서 원통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 후 후손들의 정성으로 다행히 부러진 비석을 고총 좌편 열 발자국 밖의 작은 개천 속에서 발견하였으니, 이는 곧 그 근처 80노인이 묻은 곳을 가르쳐 준 것이다. 이 비석으로써, 공의 벼슬, 성, 시호가 완연하여 가히 분별하기에 어렵지 않았으니, 제1행에 주국문경(柱國文敬), 제2행에 대부추충좌리평(大夫推忠佐理平), 제3행에 숙공윤만지묘(肅公尹漫之墓), 제4행에 1년3월일개(一年三月日改)라 하였으되 위아래가 모두 부러진 것이다. 듣는 자로 하여금 어찌 신기하게 여기지 않으랴, 윤만은 공의 처음 휘(諱)인 것이다. 좌윤공이 다시금 상소를 올리고 또다시 문강공의 유영을 찾고자 하였다. 왕도 또한 기이하게 여기사 이에 비답(批答)하여 가로되 『하늘의 밝고 밝음을 가히 알 수가 있고 경등의 지성으로 천년의 옛 비를 이미 얻었도다』하시고 본 군에 명을 내리시어 역군을 도와 묘를 보수하라 하시고, 심가의 묘를 수영(修塋)하라는 하교를 내리지 않았다. 『후에 옛 정승(故相)의 영이 있다면 그 뜻을 알 것이다. 자손 된 자의 도리로서 어찌 선조의 영을 모른다고 하겠는가?』고 역시 본도에 영을 내려 묘 만드는데 돕게 하였다.『심의 후손인 정최(廷最)가 이 뜻을 좇지 않고 경등도 싸움을 벌리면 마땅히 엄벌하겠다』는 분부였다. 갑신년(1764년) 5월 13일 석강(夕講)때에 승지 김화진이 윤면교등의 상소를 읽어 강을 마친즉 왕이 가로되 『참으로 이상하다. 당초에 서로 싸움이 벌어졌을 때 나도 과연 믿지 않았었는데 마침내 비석을 얻었으니, 역시 성의의 소치라고 본다』고 말하였다. 영상 홍봉한이 가로되『신의 생각에도 이상히 여기는 바로소이다. 백여 년간이나 잃었던 분묘를 지금에 와서 찾는다는 것은 어찌 희귀한 일이 아니겠사오리까?』고 말하자 김화진이 아뢰되『신은 윤면교의 집안과는 인척관계이므로 들었사온 바 과연 여러 달을 두고 확증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 구갈(舊碣)을 얻었으니, 그 정성과 함께 신기한 일이 아니겠사옵니까?』왕이 가로되『과연 그렇다』홍봉한이 여쭈어 가로되 『제신이 어찌 외손 된 자가 없을 수 있겠으며 전하 역시 그 외손이 아니시옵니까? 특별히 돌보아 주어야 할 줄로 아옵니다.』고 아뢰었다. 영조께서도 그 윗대의 왕비가 우리 윤씨가 많았으니 외손벌이 되는 것이다. 왕이 가로되, 『백성을 다스리기가 극히 어렵다. 본 고을에서 조묘(造墓)케 하라』고 하교하신 후『예관을 보내어 치제(致祭)케 하라』하시었다.
당초에 왕께서도 심가의 혼령에 미안하다 하고, 동산소(同山所)로써 수묘를 하라고 하시었으나, 심정최도 왕명을 어기고 자기의 조상에게만 좋도록 하려고 하였고, 우리 종중에서는 심가의 소행에 원한을 품고 있는 터이라, 그 후에도 분규를 수없이 거듭하여 상소가 연달아 올라갔다. 왕명이 비록 엄하였지만 양쪽의 싸움은 그칠 줄 몰랐다. 최후에도 심정최와 첨지공(熙復=문숙공 장파인 남원파)을 왕이 친히 불러서 심정최로부터 비석을 파묻은 것과 옮겨 세운 것을 자복케 하시고, 희복공에게는 공이 지나치게 왕에게 대들었다고 하여 죄를 다스렸으니, 이는 즉 희복공이 왕에게 『대왕은 문숙공의 외손이 아니십니까?』고 말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왕은 심가의 묘에 계단을 없애고 공의 묘소를 성분(成墳)케 하고 다시는 유영(遺塋) 찾는 일을 벌이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 자손으로서 원한을 풀지 못하고, 유한을 천추에 남기게 하였으며, 이로써 문강공의 묘소는 영원히 찾지 못한 것이다. 왕명을 어길 수 없어 후손들이 유한을 억제치 못하고 영조 40년 갑신년(1764년)에는 8도의 제종 약 8백여 명이 묘소 아래 모여 심가의 비석을 파 옮기고 문숙공의 신도비의 감춘 곳을 찾고자 하다가 심가 측과 충돌되어 편싸움을 벌어진 일도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문장(門長)인 도사(都事)벼슬을 지낸 희복공께서는 마침내 왕에게 대들어 죄를 다스림을 받아 그 장독(杖毒)으로 원통히 돌아가셨으니 우리 종중의 원한이 어떠했으랴. 그해 영조는 어제(御製)의 제문으로써 「조선국왕은 도승지 윤동섬을 보내어 고려 윤문숙공의 묘에 제사 한다」고 하여 조분(造墳)과 동시에 치제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가와의 통분으로 인연을 맺은 후손들은 그 분함을 억제치 못하여 종종 원한을 풀고자 하는 사단이 일어났다. 철종 11년(1860년) 10월 향사 때에 자산(慈山)종인 면갑이 심가의 비석을 쪼아내고 후손 희배는 향유사로서 경향 3파(파평, 남원, 함안) 제종 중에 통문을 보내어 심가의 비석을 파묻자고 하였던 바, 심가들이 원한을 품고 와서 교자(轎子) 두자를 공의 비에서 벗겨버렸는데, 다음해에 효헌공(敎成)이 교자총비를 개수립(改樹立)하였고, 음기(陰記)는 효문공(定鉉)이 썼다. 8.15광복 후에, 심가의 묘(沈墓)를 상당한 보상을 주어 이장토록 하고자 후손들과 심씨 종중사이에 논의가 있었으나, 여의치 못하여 심가 묘를 파내어 버리자는 의논이 일부에서 일어나, 양주종인 병순(昞淳)이 인부 십여 명을 데리고 밤을 타서 심가 묘를 파헤쳤으나, 워낙 계획적으로 견고하게 회를 사용하여 파묻은 탓으로, 날이 밝도록 목적을 달성치 못하였으니, 원래 그들이 후일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먼일을 생각한 것이 분명하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병순은 개성형무소에서 수개월간 옥중생활을 하였다. 백암 안응창 습유록(拾遺錄)에 『고려명상 윤모의 의관과 신발을 파주 분수원에 매장하였으되, 다만 고찰할만한 각석(刻石)이 없어 후손들이 그 묘처를 잃었다. 근세에 와서 심상지원(沈相之源)이,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장지를 정하였으나, 이곳이 윤상(尹相)의 장산(葬山)이다. 흙을 팔 때 그 묘지를 얻었지만 수습하여 쓰지 않고 묘지를 없애므로, 윤씨가 그 분영(墳塋)을 찾지 못하여, 전부가 심씨 문중으로 귀속되었다.』고 쓰여 있다. 심지원의 조부 종침의 장사 날이 광해군 6(1614)년이니, 안응창의 나이가 12세였고, 그 아버지 심설의 장사 날이 인조 3년이요, 지원의 장사가 현종 3(1662)년으로서 처음에 장사지낼 때에는, 청룡밖 이가산 근처였는데, 그 후에 이장하여 문숙공 산소의 상광(上壙)을 눌러 쓴 것이다. 이와 같이 심가들이 장사지낸 후 영조 정묘년에 발견되었다면 우리 후손으로써는 근 백년 만에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선조의 묘소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였고, 후손들로서 성실치 못한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후 1950년 6.25사변 이후에도 문숙공의 묘소에 대해서 심가 측과 끊임없는 분규가 일어나고 있다가, 1969년 심가 묘와의 사이에 곡장(曲墻)을 쌓았다. 공의 묘소에는, 묘표음기(墓表陰記)가 있고, 묘지(墓誌)가 있으며, 또한 신도비(神道碑)가 있는데, 묘표음기에는 묘소를 실전한 것으로부터 되찾은 경위를 기록하였는데, 21대손 정헌대부 전공조판서 겸 세자시강원찬선 봉구가 지으셨고, 22대손 가선대부 사헌부대사헌 겸 동지춘추관사 동섬(東暹)은 전면에 큰 자로「고려수태보문하시중영평백문숙공윤관지묘(高麗守太保門下侍中鈴平伯文肅公尹瓘之墓)」라고 쓰고, 22대손 통정대부 사간원 대사간지제교 방(坊)은 음기를 쓰셨다. 그리고 묘지는 공의 행적을 그대로 기록한 것인바, 26대손 숭정대부 이조판서 겸 예문관제학 자승(滋承)이 쓴 것이다. 또한 신도비는 1966년에 서울에 사는 후손 경수(敬秀)가 단독으로 성재를 내어 세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