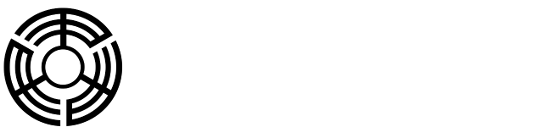윤관고려사열전
윤관(尹瓘)의 자(字)는 동현(同玄)이요 파평현인(坡平縣人)이니 고조 신달이 태조를 도와 삼한공신이 되었고, 父 집형은 검교소부소감이 되었다. 관이 문종조에 등재하여 습유보궐(拾遺補闕)을 지냈고 숙종 때에 여러 번 옮기어 동궁시강학사 어사대부 이부상서 한림학사 승지가 되었다. 여진은 본시 말갈의 유종(遺種)으로 수 당년 간에는 고구려에 병합한바 있었고 뒤에는 취락으로 산택(山澤)에 흩어져 살아 통일함이 없었다. 그 중에서 정주, 삭주 부근 지방에 있는 자는 혹 내부(內附)하여왔다. 하여도 잠깐 신속(臣屬)하였다가는 곧 배반하곤 하였는데 영가(盈哥)와 우야소(鳥雅束)가 서로 이어 추장이 됨에 미쳐 자못 여러 사람의 마음을 얻어 그 세력이 점차로 횡행하였다. 이위(伊位) 경계 상에 연산(連山)이 있으니 동해안으로부터 굴기(屈起)하여 우리 북쪽변경에 이르러서는 험준하고 황폐하여 사람과 말이 지나갈 수가 없었다. 그 사이에 한 지름길이 있어 속칭 병목이라 하였으니 그 출입이 한 구멍뿐임을 말함이다. 공(功)을 탐하는 자는 간간이 의논을 드리기를 그 길을 막으면 오랑캐의 길이 끊어질 것이니 청컨대 군사를 내어 평정하고자 하였다. 7년(숙종)에 여진이 정주 관밖에 와서 주둔하거늘 그들이 우리를 도모함인가 의심하여 추장인 허정 및 나불 등을 유인해서 잡아 광주에 가두고 고문하니 과연 우리를 도모코자 함이라 드디어 억류하고 보내지 않았다. 때마침 변장(邊將) 이일숙 등이 아뢰기를31 『여진이 허약하니 족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때를 잃고 취하지 않으면 뒤에 반드시 우환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우야소가 또 별부(別部)인 부내노(夫乃老)와 틈이 생겨 군사를 내어 그를 치고 우리 가까운 지경에 와서 주둔하거늘 왕이 임간에게 명하여 가서 방비케 하니 간이 공을 탐하여 군사를 끌고 깊이 들어가 치다가 패하여 죽은 자가 반이나 됨에 여진이 승세를 타서 정주, 선덕관성(關城)에 닥쳐들어 수없이 죽이고 노략질하거늘 이에 관으로 간을 대하여 동북면행영도통을 삼고 부월을 주어 보내니 관이 더불어 싸워 30여급을 베었으나 우리 군사가 함몰되어 죽고 상한 자도 반이 넘는지라 군세가 떨치지 못하므로 드디어 겸손한 말로써 강화하여 맹약을 체결하고 돌아오니 왕이 분을 내어 천지신명에게 고하기를 『바라건대 음덕을 빌려 적경(賊境)을 소탕케 하겠다』하고 이에 그 땅에 불우(佛宇)를 창건할 것을 허(許)하였다. 관은 참지정사 판상서형부사 겸 태자빈객으로 옮겨 아뢰기를 『신이 적의 기세를 봄에 강성함이 측량하기 어렵사오니 마땅히 군사를 휴양시켜 후일을 기다릴 것입니다. 또 신의 패한 바는 적은 기병이요 우리는 보병이라 가히 당적 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건의하여 처음으로 별무반을 세우고 문무산관과 이서(吏胥)로부터 상가(商賈), 복예(僕隸) 및 부 군 현에 이르기까지 무릇 말(馬)을 가진 자는 다 신기를 삼고 말이 없는 자는 신보, 도탕(跳蕩), 경궁(梗弓), 정노(精弩), 발화(發火)등 군을 삼아 나이 20이상인 남자는 과거보는 이가 아니면 다 신보에 속하고 무반(武班)과 모든 진부(鎭府)의 군인은 사시(四時)로 훈련하고 또 승도를 뽑아 항마군을 삼고 드디어 군사를 훈련하며 곡식을 저축하여 다시 치기를 꾀하였다. 관이 중서시랑동평장사에 올랐다. 예종이 즉위하여 상(喪)으로 군사 낼 겨를이 없었다. 2년에 변방 장수가 보고하기를 『여진이 장성하여 변성(邊城)에 침돌(侵突)하는데 그 추장이 한 호리병박에 꿩꼬리 깃을 달아서 모든 부락에 돌려 보이면서 일을 의논하니 그 마음을 측량할 수 없다』고 하니 왕이 듣고 중광전(重光殿) 불감(佛龕)에 감추어 두었던 숙종의 맹세한 글을 내어서 양부대신에게 보이니 대신이 받들어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성고(聖考: 숙종)의 끼친 뜻이 이같이 깊고 간절하시니 어찌 이것을 잊으리까?』하고 이에 글을 올려 선왕의 뜻을 이어 치기를 청하니 왕(예종)이 유예하여 결단치 못하고 평장사 최홍사에게 명하니 대묘(大廟)에 서(筮)쳐 기제괘(旣濟卦)를 얻음에 드디어 출사(出師)하기를 의정(議定)하여 관으로 원수를 삼고 지추밀원사 오연총으로 부원수를 삼으니 관이 아뢰기를『신이 일찍이 성고의 밀지를 받았고 이제 또 엄명을 받으니 어찌 감히 3군을 통솔하여 적의 진을 깨뜨리고 우리 강토를 넓혀서 나라의 수치를 씻지 않겠나이까?』하니 연총이 자못 의심하여 가만히 관에게 말하니 관이 개연히 말하기를 『그대와 내가 아니면 누가 능히 만 번이나 죽을 땅에 나가서 나라의 수치를 씻으리오 계책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또 무엇을 의심하느냐?』하니 연총이 말이 없었다. 왕이 서경에 행차하여 위봉루에 거동하고 부월(斧鉞)을 주어 보내었다. 관과 연총이 동계(東界)에 이르러 장춘역에 군사를 주둔하니 무릇 17만인데 20만이라고 이름하고 병마판관 최홍정 황군상을 나누어 보내 정장(定長) 2주에 들어가서 여진 추장에게 속여 말하기를 『나라에서 장차 허정(許貞) 나불(羅弗)등을 놓아 돌려보내려 하니 가히 와서 명을 들을 것이다』하고 복병 하여 기다리니 추장이 이 말을 믿고 고라(古羅)등 4백 여인이 이르거늘 술을 마시어 취하게 하고 복병이 나와 그를 죽이는데 그 가운데 건장하고 꾀 있는 자 5~60명이 관문에 이르러 의심하고 들어오기를 즐기지 않거늘 병마판관 김부필, 녹사 척준경을 시켜 길을 나누어 군사를 잠복시키고 또 홍정을 시켜 정예한 기병을 거느려 그를 응전(應戰)케 하여 거의 다 잡아 죽였다. 관이 스스로는 5만 3천인으로써 정주 대화문으로 나가고, 중군병마사 좌복야 김한충은 3만6천7백인으로써 안육술(安陸戌)로 나가고, 좌군병마사 좌상시 문관은 3만3천9백인으로써 정주 홍화문으로 나가고, 우군병마사 병부상서 김덕진은 4만3천8백인으로써 선덕진안해로 나가 양술(兩戌)의 사이를 방어케 하고, 선병별감 이부원외랑 양유속, 원흥도부서사 정숭용과 진명도부서부사 견을도 등은 선병(船兵) 2천6백으로써 나가게 하였다. 관이 대내파지촌(大乃巴只村)을 지나 한나절 행군하니 여진이 우리 군사의 기세가 심히 성함을 보고 다 도망하여 달아나고 오직 가축만 들에 깔려 있었다. 문내이촌(文乃泥村)에 이르니 적이 동음성(冬音城)에 들어가 보존하거늘 관이 병마영할 임언과 홍정을 보내어 날랜 군사를 거느리고 급히 쳐 깨뜨려 쫓아버렸다. 좌군은 석상하에 이르러 여진이 모여 있음을 보고 통역 대언을 보내어 항복하기를 설유하니 여진이 답하기를 『우리는 한번 싸워서 승부를 결단할 것이오, 어찌 항복한다 하리요』하고 드디어 석성에 들어가서 거전(拒戰)하니 화살과 돌이 빗발 같아서 군사가 능히 못하였다. 관이 준경에게 말하기를 『해는 저물고 일은 급하니 그대가 가히 장군 이관진으로 더불어 이를 치겠느냐?』고 하니 대답하기를 『내가 일지기 종사(從事)할 때에 과오로 죄를 범하였는데 공이 나를 장사(壯士)라고 하여서 조정에 청하여 죄를 용서하게 하였으니 오늘은 이 준경이 몸을 죽이며 보답할 때입니다.』하고 드디어 석성 하에 이르러 갑옷을 둘러 입고 방패를 가지고 적중에 달려들어 추장 수인을 쳐 죽이니 이에 관의 휘하도 좌군과 합해 쳐서 죽기로 싸워 크게 깨뜨리니 적이 혹은 스스로 암석에 투신하며 노유(老幼)와 남녀가 모두 죽었다. 준경에게 능라(綾羅) 30필을 상주고 또 홍정, 부필, 녹사 이준양을 보내어 이위동(伊位洞)을 치니 적이 역전하므로 오래 싸워 이기고 1천2백급을 베었다. 중군은 고사한등 35촌을 깨뜨리어 3백80급을 베고 2백30인을 사로잡았으며, 우군은 광탄등 32촌을 깨뜨리어 2백90급을 베고 3백인을 사로잡았고, 좌군은 심곤등 31촌을 깨뜨리어 9백50급을 베었다. 관의 군사는 대내파지로부터 37촌을 깨뜨리어 2천1백20급을 베고 5백인을 사로잡고 녹사 유영약을 보내어 싸움에 이겼음을 보고하니 왕이 기뻐하여 영약에게 정7품을 주고 좌부승지병부랑중 심후, 내시형부원외랑 한교여를 명해 조(詔)를 사(賜)하여 장유하고 두 원수 및 모든 장수에게 물품을 사(賜)하되 차등 있게 하였다. 관이 제장을 나누어 보내어 지계(地界)를 확정하되 동으로는 화관령에 이르고, 북으로는 궁한이령(弓漢伊嶺)에 이르고, 서로는 몽라골령에 이르렀으니 또 일관 최자호를 보내어 몽라골령 하에 터를 잡아 성랑 9백50간을 쌓아 영주라 이름하고, 화관령(火串嶺)하에 9백22간을 쌍아 웅주(雄州)라 이름하고, 吳林金村에 7백74간을 쌓아 복주(福州)라 이름하고 弓漢伊村에 6백70간을 쌓아 길주라 이름하고 또 호국인왕(護國仁王), 진동보제(鎭東普濟) 두 절을 영주성 가운데 창건하였다. 이듬해에 관과 연총이 정예한 군사 8천을 거느리고 가한촌(加漢村)의 작은 길로 나아가니 적이 울밀한 숲 속에 복병 하였다가 관의 군사 오는 것을 기다려 급히 치니 군사가 다 무너져 겨우 10여인만 있었는데 적이 관등을 여러 겹으로 포위함에 연총은 유시(流矢)에 맞아 형세가 심히 위급하거늘 준경이 용맹한 군사 10여인을 거느리고 구원하려 하니 아우 낭장 준신이 저지하여 말하기를『적의 진이 견고하여 가히 깨뜨리지 못할 것이니 헛되이 죽으면 무엇이 유익하리까?』하니 준경이 말하기를『너는 돌아가서 늙은 아버지를 봉양하라. 나는 몸으로써 나라에 허락하였으니 의리상 가히 그칠 수 없다』하고 이에 크게 외치면서 진중에 달려들어 10여인을 쳐 죽이니 홍정, 관진등이 산골짜기로부터 군사를 끌고 와서 구원함에 적병이 이에 포위를 풀고 달아나거늘 쫓아가 36급을 베었다. 추장 아로환(阿老喚)등 403인이 진전(陣前)에 나와 항복을 청하고 남녀 1천4백60여인을 또 좌군에 항복하였는데 적의 보졸과 기병 2만이 와서 영주성 남쪽에 진치고 크게 외쳐 싸움을 돋우거늘 관이 임언(林彦)으로 더불어 말하기를 『저들은 많고 우리는 적어서 형세가 당적 할 수 없으니 다만 굳게 지킬 뿐이다』하니 준경이 말하기를『만약 나가 싸우지 않았다가 적의 군사는 날로 더하고 성중은 양식이 다하고 밖으로 구원이 이르지 않으면 장차 어찌할 것이요. 전일의 싸움에 이긴 것을 제공은 보지 못하였소? 오늘 또한 사력을 내어 싸울 테니 청컨대 제공은 성에 올라서 경결하시오』하고 이에 결사대를 거느리고 성을 나가 적과 싸워 19급을 베니 적이 패하고 상하여 피를 흘리면서 도망해 달아났다. 준경이 군악을 울리며 개선하여 돌아오니 관등이 루에서 내려와 그를 맞아 손을 이끌어 서로 절하였다. 관과 연총이 이에 모든 장수를 거느리고 중성대도독부에서 회합하니 권지승선(權智承宣) 왕자지(王字之)가 공험성으로부터 군사를 거느리고 도독부로 오다가 갑자기 여진 추장 사현(史現)의 군사를 만나 더불어 싸워 불리하여 탄 말을 잃었는데 준경이 곧 굳센 군사를 끌고 가서 구원하여 이를 패배시키고 적의 갑옷과 말을 취하여 돌아왔다. 여진의 군사 수만이 와서 웅주를 포위함에 홍정이 군사를 독려하니 군사들이 다 싸우기를 생각하거늘 곧 4문(四門)을 열고 함께 나가 용전하여 크게 이를 패배시키고 80급을 부참(斧斬)하고 병차 50여량, 중차 2백량, 말 40필을 얻으니 그 나머지 병기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때에 준경이 성중에 있었는데 주수(州守)가 말하기를 『성을 지킴이 날이 오래 됨에 군량이 장차 다하고 외원(外援)이 이르지 않으니 공이 만약 성을 나가서 군사를 거두고 돌아와 성중을 구하지 않으면 사졸이 한 사람도 남지 않을까 두려워한다』하거늘 준경이 군졸의 떨어진 옷을 입고 밤에 성에서 줄을 타고 내려 정주에 돌아와 군사를 정돈하고 통태진(通泰鎭)으로 가서 야등포(也等浦)로부터 길주에 이르러 적을 만나 더불어 싸워 크게 이를 패배시키니 성중 사람이 감격하여 울었다. 관이 또 영, 복, 웅, 길, 함주 및 공험진에 성을 쌓고 드디어 공험에 비를 세워 경계를 삼고 아들 언순을 보내어 표문을 만들어 칭하(稱賀)하였다. 왕이 내시위위주부 강영준을 보내어 관 등에게 양, 술을 하사하시고 아울러 군인에게도 은사라 1면, 은병 40개를 하사하였다. 관이 또 임언을 시켜 그 일을 영주 청벽(廳壁)에 기록하게 하니, 그 글에 말하기를,『맹자 말씀에 약(弱)은 본래 강(强)을 당적하지 못하며 소(小)는 본래 대(大)를 당적하지 못한다. 나는 이 말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야 이 말을 믿겠노라』고 하였다. 여진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강약과 중과(衆寡)에 있어 그 세력이 현격한데도 변방을 엿보아서, 숙종 10년에 틈을 타고 난리를 일으켜 사민을 많이 죽이고 붙들어 매어 노예를 삼은 것도 많았으므로, 숙종이 크게 노하여 군사를 정비하여 장차 대의(大義)를 잡고서 치려 하다가, 애석하게도 그 공을 이룩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시었고, 지금 임금이 위를 이어 3년 거상(居喪)하였다가 상기(喪期)를 겨우 마치시고는, 좌우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진은 본시 고구려의 부락으로 개마산 동쪽에 모여 살아서 대대로 조공을 바치어 우리 조종(祖宗)의 은택을 입음이 깊었는데, 갑자기 무도하게 배반하니 선고(先考)께서 깊이 분노하시었다. 『일찍이 듣건대 옛 사람이 대효(大孝)라 일컬음은 그 뜻을 잘 이음이라 하였으니 내가 지금 다행히 상기(喪期)를 마치고 나랏일을 보게 되니 어찌 의기(義旗)를 들어 무도한 것을 쳐서 한번 선군(先君)의 수치를 씻지 않으리오』하시고, 수사도 중서시랑평장사(守司徒 中書侍郞平章事) 윤관을 명하여 행영대원수를 삼고, 지추밀원사 한림학사승지 오연총을 부원수를 삼아 정병(精兵) 30만을 거느리고 정벌을 전담케 하였으니, 윤공은 사람이 걸출하여 일찍이 김유신의 사람됨을 사모하여 말하기를, 유신이 6월에 배도 없이 3군을 도강(渡江)케 하였다하니 다름이 아니라 지성일 따름이나 나도 또한 어떤 사람이냐고 하였으니 그 지성이 감동한 바에 영이한 흔적이 많이 들렸으며, 오공은 때에 중망이 있는 이로, 타고난 성품이 근신하여서 일을 당하면 반드시 세 번이나 생각하므로 양도(良圖)와 대책(大策)이 시행하면 맞지 않음이 없었다. 양공이 일찍이 이에 뜻이 있었으므로 명을 듣고 분발하여서 군사를 이끌고 동으로 내려가서 군사를 내는 날에는 몸소 갑옷과 투구를 걸치고, 여러 사람에게 맹세하기도 전에 강개한 눈물을 뿌리니 명령을 듣지 않는 자가 없었다. 적경에 들어감에 미쳐서는 3군이 용맹을 떨치어 한사람이 100을 당적 하니 마른 가지를 꺾고 대를 쪼갬인들 어찌 이보다 더 쉬울 수 있으리오. 6천 여급을 참수하니 그 궁시를 싣고 진 앞에 와서 항복하는 자가 5천을 넘었으며 전진(戰塵)을 바라보고 간담이 떨려서 도망쳐 달아나는 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아아! 여진이 완고하고 어리석어 그 강약과 중과(衆寡)의 형세를 헤아리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함을 취함이 이와 같았도다. 그 지방이 3백리인데 동으로는 대해(大海)에 이르고, 서로는 개마산에 끼었고, 남으로는 장정(長 定) 2주에 대었으니 산천의 수려함과 토지의 기름짐은 가히 우리 백성을 살게 할만하며 본래 고구려의 소유이라, 그 고비(古碑)의 유적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 대저 고구려가 전에 잃었던 것을 지금 임금이 뒤에 이것을 얻었으니 어찌 천명이 아니리요. 이에 새로 6성을 쌓아 1은 진동군함주대도독부(鎭東軍咸州大都督府)이니 병민이 1천9백48정호(丁戶)요, 2는 안령군영주방어사(按嶺軍英州防禦使)이니 병민이 1천2백38정호(丁戶)요, 3은 영해군웅주방어사(寧海軍雄州防禦使)이니 병민이 1천4백36정호(丁戶)요, 4는 길주방어사(吉州防禦使)이니 병민이 6백80정호(丁戶)요, 5는 복주방어사(福州防禦使)이니 병민이 6백32정호(丁戶)요, 6은 공험진방어사(公?鎭防禦使)이니 병민이 5백32정호(丁戶)라 그 현달하고 현재(賢材)가 있어 능히 그 임무를 감당할 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 땅을 진무(鎭撫)케 하니 시(詩)에 이른바 번(蕃)하며 선(宣)하여서 왕실을 번병(藩屛)한다 함이니 편안히 베개를 높이하고 동으로 돌아볼 근심이 없음을 보겠도다. 원수(元帥)가 나에게 이르기를 옛적에 당나라 재상 배진공이 회서(淮西)에 출정하여 평정하였을 때 그 막객(幕客)인 한유(韓愈)가 비문을 지어 그 일을 넓게 하였기 때문에 뒷사람이 헌종의 영위절인(英偉絶人)한 덕을 알아서 노래하고 칭송하였다. 그대가 다행히 이에 종사하여 그 본말을 자세히 하여 어찌 기문(記文)을 지어 우리 성조(聖朝)위 전무한 위적(偉績)을 무궁토록 전하지 않겠는가 하므로, 언(彦)이 명을 받고 붓을 잡아 이를 기록한다 하였다. 관이 포로 3백46명, 말 96필, 소 3백 여두를 바치고 의주를 비롯하여 통태, 평륭 2진에 성을 쌓아 함, 영, 웅, 길, 복주와 공험진을 아울러 북계(北界)9성을 쌓고 모두 남계(南界)의 백성을 옮기어 채웠다. 왕이 관을 추충좌리평융척지진국공신 문하시중 판상서리부사 지군국중사(推忠佐理平戎拓地鎭國功臣 門下侍中 判尙書吏部事 知軍國重事)에 임명하고 연총을 협모동덕 치원공신상서좌복야 참지정사(協謨同德 致遠功臣尙書左僕射 參知政事)에 임명하여 내시랑중 한교여를 보내어 조서와 고신(告身) 및 자수안구(紫繡鞍具)와 구마(廐馬) 2필을 가지고 웅주에 가서 나누어주게 하였다. 윤관이 개선하니 왕이 명하여 고취(鼓吹)와 군위를 갖추어 맞이하게 하고 대방후(帶方侯) 보(黼), 제안후(齊安侯) 서를 보내어 동교(東郊)에서 위로하고 향연 하였다. 관과 연총이 경령전에 나아가 복명하고 부월을 드리니 왕이 문덕전에 거동 하여 인견하고 변방 일을 묻고 밤이 되어 파하였다. 얼마 안 되어 여진이 또 웅주를 포위하거늘 왕이 연총을 보내어 구원케 하고 다시 관을 보내어 치게 하니 관이 적의 머리 31급을 바치었으므로 조금 뒤에 관을 영평현개국백(鈴平縣開國伯) 식읍2천5백호(식실봉3백호)를 봉하고 연총은 양구진국(攘寇鎭國) 공신호을 가하였다. 또 이듬해에 여진이 길주를 포위하거늘 연총이 더불어 싸워 크게 패하였으므로 왕이 또 관을 보내어 구원할 새 근신(近臣)을 명하여 금교(金郊)역에서 전송케 하였다. 관과 연총이 정주로부터 군사를 지휘하여 길주로 향할 때 행차가 나복기촌(那卜其村)에 이르니 함주사록(咸州司錄) 유원서가 치보(馳報)하기를 『여진의 공형(公兄), 노불, 사현(史顯)등이 성문을 두드리고 말하기를 우리들이 이제 아지고촌(阿之古村)에 이름에 태사 우야소(鳥雅束)가 화친을 청하고자 하여 나를 시켜 병마사에게 전하라고 하였으나 방금 군사가 서로 싸우므로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니 청컨대 사람을 우리 고장에 보내면 태사의 설유한 바를 자세히 전고(傳告)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하거늘 관등이 듣고 도로 성에 들어와서 다음날 병마기사 이관중을 적의 고장에 보내어 여진의 장수 오사(吳舍)에게 이르기를 『강화함은 병마사의 마음대로 할 바가 아니니 마땅히 公兄등을 보내어 천정(天庭)에 들어가서 아뢸 것이라』하니 오사 등이 크게 기뻐하였다. 노불, 사현(史顯)등이 다시 함주에 와서 고하기를 『우리들이 입조(入朝)하기를 원하나 때가 방금 서로 싸우므로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성을 들어가지 못하니 청컨대 관인으로써 서로 볼모를 교환하자』고 하거늘 관이 공요(孔沃), 이관중(李管仲), 이현(異賢)등으로 볼모로 삼음에 노불 등이 드디어 와서 구성지(9城地)를 돌려주기를 청하였다. 처음 조정의논이 병목(甁項)을 얻어 그 길만 막으면 오랑캐의 근심이 길이 끊어질 것이라 하였더니 뒤에 쳐서 취해놓고 보니 수륙(水陸)으로 도로가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 앞에 들은 바와는 심히 다른 것이었다. 여진이 이미 소굴을 잃었기에 보복하기를 맹세하고 이에 땅을 돌려주기를 강인(强引)하여 여러 추장들이 해마다 와서 다투므로 궤모(詭謀)와 병계(兵械)가 이르지 않는 바가 없되 성이 험하고 굳기 때문에 갑자기 적에게 점령당하는 일은 없지만 싸우고 지킴에 당하여 우리 군사를 상실한 것도 또한 많았으며 또 땅을 개척함이 너무 넓고 9성의 거리가 너무 멀고 계동(溪洞)이 황심(荒深)하므로 적이 자주 복병 하여 왕래하는 자를 노략하는지라 나라에서 군사를 냄이 다단(多端)하며 중외가 소요한데 기근과 질역(疾疫)이 가중하여 원성이 드디어 일어나고 여진도 역시 괴로워하였으므로 이에 이르러 왕이 여러 신하를 모아 이를 의논하여 필경에 9성을 여진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싸우는 군수품이나 식량은 내지(內地)에 실어 들여 그 성을 철폐하였다. 평장사 최홍사, 김경용, 참지정사 임의, 추밀원사 이위가 선정전(宣政殿)에 들어가 임금을 대하여 관과 연총의 패군 한 죄를 극론하니, 왕이 승선 심루를 보내어 도중에서 부월을 거두므로 관등이 복명하지 못하고 사제(私第)로 돌아갔다. 재상과 대간이 그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고 간신 김연, 이재등은 대 궐에 엎드려 굳이 다투어 말하기를『관등이 망령되어 이름 없는 군사 일으켜 패군하고 나라를 해되게 하였으므로 죄가 가히 용서할 수 없으니 청컨대 옥리(獄吏)를 내리소서』하는지라 왕이 심후에게 명하여 선유(宣諭)하기를, 『두 원수는 명을 받들어 출정함이오. 예로부터 싸움은 승패가 있는 것이니 어찌 죄가 되리요.』하니 연(緣)등이 또 다투어 마지않으므로 왕이 마지못하여 다만 벼슬을 면하고 공신호를 깎았다가 곧 관을 수태보문하시중 판병부사상주국 감수국사(守太保門下侍中 判兵部事上柱國 監修國史)로 제배(除拜)하니, 관이 표문을 올려 사양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고 말하기를, 『짐(朕)이 듣건대 옛날 이광리(李廣利)가 대완(大宛)을 쳤을 때에 겨우 준마 30필을 얻어왔는데, 무제(武帝)는 만리 밖에 가서 정벌하였다 하여 그 과실을 기록하지 않았고, 진탕(陳湯)은 질지(?支)를 주벌(誅伐)할 때에 임금의 병을 받지 않고, 함부로 군사를 일으켰는데도 선제(宣帝)가 위엄이 백만(百蠻)에 떨치었다고 하여 봉하여 열후(列侯)를 삼았는데, 경이 여진을 친 것은 선고의 뜻을 받고, 과인의 계술(繼述)하는 일을 체(體)하여 몸소 칼날과 화살을 무릅쓰고 깊이 적의 진중에 들어가서 죽이고 사로잡음이 이루 헤아리지 못하여 넓은 땅을 개척하고 9주의 성을 쌓아서 나라의 묵은 수치를 씻었으니, 경의 공은 가히 많다고 이르겠다. 그러나 오랑캐는 본래 사람의 얼굴이나 짐승의 마음이라 배반하고 항복함이 무상하므로, 그 남은 무리들이 의거할 곳이 없어졌기 때문에 추장이 항서(降書)를 바치고 화친을 청하므로 여러 신하가 다 편하다 하고 짐도 또한 차마 하지 못하여, 드디어 그 땅을 돌려주었거늘 유사들이 법을 지켜 자못 탄핵함이 있으므로 갑자기 그 벼슬을 빼앗았으나, 짐은 끝까지 경을 허물하지 않고 맹명(孟明)이 다시 강을 건넘이 있기를 바라노라. 이제 경에게 주는 것은 곧 경의 본래의 벼슬이니 어찌 사양하리요. 마땅히 돌보는 마음을 살펴서 속히 그대 벼슬에 나아갈 지어다』라고 하니, 관이 다시 글로써 사양하였으나 또 듣지 않았다. 예종 6년에 졸(卒)하니 문경(文敬)이라 시(諡) 하였다. 관이 젊어서 학문을 좋아하여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장상(將相)이 되어 비록 군중(軍中)에 있어서도 항상 오경(五經)을 휴대하였고, 어진 이를 좋아하고 착한 것을 즐거워함이 한때에 으뜸이었다. 인종 8년에 예종 묘정(廟庭)에 배향되고 수능(綏陵)의 휘를 피하여 시(諡)를 문숙(文肅)으로 고쳤다. 7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언인(彦仁), 언순(彦純), 언암(彦巖), 언식(彦植), 언이(彦頤), 언민(彦旼)이며, 언순은 벼슬이 남원부사에 이르렀고, 언식은 천자(天資)가 높고 아담하며 빈객(賓客)을 좋아하였으며, 벼슬은 수사공(守司空)에 이르렀다. 언민은 총명하고 영오함이 뛰어났으며 서화를 잘하고 인종조에 상식봉어(尙食奉御)가 되었다.
尹瓘, 字同玄, 坡平縣人. 高祖莘達, 佐太祖, 爲三韓功臣, 父執衡, 檢校少府少監. 瓘, 文宗朝登第, 歷拾遣補闕, 肅宗時, 累遷東宮侍講學士御史大夫吏部尙書翰林學士承旨. 女眞, 本靺鞨遺種, 隋唐閒, 爲勾高麗所幷, 後聚落, 散居山澤, 未有統一. 其在定州·朔州近境者, 雖或內附, 乍臣乍叛. 及盈哥·烏雅束, 相繼爲酋長, 頗得衆心, 其勢漸橫. 伊位界上, 有連山, 自東海岸崛起, 至我北鄙, 險絶荒翳, 人馬不得度. 閒有一徑, 俗謂甁項, 言其出入一穴而已. 邀功者, 往往獻議, 塞其徑, 則狄人路絶, 請出師平之. 七年, 女眞來屯定州關外, 疑其圖我, 誘執酋長許貞及羅弗等, 囚廣州栲問, 果謀我也, 遂留不遣. 會邊將李日肅等奏, “女眞虛弱, 不足畏. 失今不取, 後必爲患.” 烏雅束, 又與別部夫乃老有隙, 發兵攻之, 來屯近境, 王命林幹, 往備之. 幹邀功, 引兵深入, 擊之敗績, 死者大半. 女眞乘勝, 闌入定州宣德關城, 殺掠無算, 乃以瓘代幹, 爲東北面行營都統, 授鈇鉞遣之. 瓘與戰, 斬三十餘級, 我軍陷沒死傷者過半, 軍勢不振, 遂卑辭講和結盟而還. 王發憤告天地神明, 願借陰扶, 掃蕩賊境, 仍許其地創佛宇. 瓘, 遷叅知政事判尙書刑部事兼太子賓客, 奏曰, “臣觀賊勢, 倔强難測, 宜休徒養士, 以待後日. 且臣之所以敗者, 賊騎我步, 不可敵也.” 於是, 建議始立別武班, 自文武散官吏胥, 至于商賈僕隸, 及州府郡縣, 凡有馬者爲神騎, 無馬者爲神步·跳蕩·梗弓·精弩·發火登軍. 年二十以上男子, 非擧子, 皆屬神步, 西班與諸鎭府軍人, 四時訓錬, 又選僧徒爲降魔軍, 遂鍊兵畜穀, 以圖再擧. 進中書侍郞同平章事. 睿宗卽位, 以喪, 未遑出師, 二年, 邊將報, “女眞强梁, 侵突邊城. 其酋長, 以一胡蘆縣雉尾, 轉示諸部落以議事, 其心叵測.” 王聞之, 出重光殿, 佛龕所藏肅宗誓䟽, 以示兩府大臣. 大臣奉讀, 流涕曰, “聖考遺旨, 深切若此, 其可忘諸?” 乃上書, 請繼先志伐之. 王猶豫未決, 命平章事崔弘嗣, 筮于太廟, 遇坎之旣濟, 遂定議出師, 以瓘爲元帥, 知樞密院事吳延寵副之. 瓘奏, “臣嘗奉聖考密旨, 今又承嚴命, 敢不統三軍破賊壘, 拓我疆土, 以雪國恥.” 延寵頗以爲疑, 微語瓘, 瓘慨然曰, “微公與我, 誰能出萬死之地, 以雪國家之恥? 策已決矣, 又何疑焉?” 延寵黙然. 王幸西京, 御威鳳摟, 賜鈇鉞遣之. 瓘·延寵, 至東界, 屯兵于長春驛, 凡十七萬, 號二十萬. 分遣兵馬判官崔弘正·黃君裳, 入定·長二州, 紿謂女眞酋長曰, “國家將放還許貞·羅弗等, 可來聽命.” 設伏以待. 酋長信之, 古羅等四百餘人至, 飮以酒醉, 伏發殲之. 其中壯黠者五六十人, 至關門, 持疑不肯入, 使兵馬判官金富弼·錄事拓俊京, 分道設伏, 又使弘正, 帥精騎應之, 擒殺殆盡. 瓘自以五萬三千人, 出定州大和門, 中軍兵馬使左僕射金漢忠, 以三萬六千七百人, 出安陸戍, 左軍兵馬使左常侍文冠, 以三萬三千九百人, 出定州弘化門. 右軍兵馬使兵部尙書金德珍, 以四萬三千八百人, 出宣德鎭安海, 拒防兩戍之閒, 船兵別監吏部員外郞梁惟竦, 元興都部署使鄭崇用, 鎭溟都部署副使甄應圖等, 以船兵二千六百, 出道鱗浦. 瓘過大乃巴只村, 行半日, 女眞見軍勢甚盛, 皆遁走, 唯畜産布野. 至文乃泥村, 賊入保冬音城. 瓘遣兵馬鈴轄林彦與弘正, 率精銳急攻破走之. 左軍到石城下, 見女眞屯聚, 遣譯者戴彦諭降, 女眞答曰, “吾欲一戰以決勝否, 何謂降歟.” 遂入石城拒戰, 矢石如雨, 軍不能前. 瓘謂俊京曰, “日吳事急, 爾可與將軍李冠珍攻之.” 曰, “僕嘗從事長州, 過誤犯罪, 公謂我壯士, 請于朝宥之, 今日, 是俊京殺身報効之秋也.” 遂至石城下, 環甲持楯, 突入賊中, 擊殺酋長數人. 於是, 瓘麾下, 與左軍合擊, 殊死戰, 大破之, 賊或自投巖石, 老幼男女殲焉. 賞俊京, 綾羅三十匹, 又遣弘正·富弼, 錄事李俊陽, 擊伊位洞, 賊逆戰, 久乃克之, 斬一千二百級. 中軍破高史漢等三十五村, 斬三百八十級, 虜二百三十人, 右軍破廣灘等三十二村, 斬二百九十級, 虜三百人. 左軍破深昆等三十一村, 斬九百五十級, 瓘軍自大乃巴只, 破三十七村, 斬二千一百二十級, 虜五百人, 遣錄事兪瑩若, 告捷. 王喜賜瑩若爵七品, 命左副承旨兵部郞中沈侯, 內侍刑部員外郞韓皦如賜詔, 獎諭兩元帥及諸將, 賜物有差. 瓘又分遣諸將, 畵定地界, 東至火串嶺, 北至弓漢伊嶺, 西至蒙羅骨嶺. 又遣日官崔資顥, 相地於蒙羅骨嶺下, 築城廊九百五十閒, 號英州, 火串嶺下, 築九百九十二閒, 號雄州, 吳林金村, 築七百七十四閒, 號福州, 弓漢伊村, 築六百七十閒, 號吉州, 又創護國仁王·鎭東普濟二寺於英州城中. 明年, 瓘·延寵, 率精兵八千, 出加漢村甁項小路, 賊設伏叢薄閒, 候瓘軍至, 急擊之, 軍皆潰, 僅十餘人在. 賦圍瓘等數重, 延寵中流矢, 勢甚危急, 俊京率勇士十餘人, 將救之. 弟郞將俊臣止之曰, “賊陣牢不可破, 徒死何益?” 俊京曰, “爾可歸養老父, 我以身許國, 義不可止.” 乃大呼突陣, 擊殺十餘人. 弘正·冠珍等, 自山谷引兵來救, 賊乃解圍而走, 追斬三十六級. 瓘等, 以日晩, 還入英州城, 瓘涕泣執俊京手曰, “自今, 我當視汝猶子, 汝當視我猶父.” 承制, 授閤門祇候. 酋長阿老喚等四百三人, 詣陣前請降男女一千四百六十餘人, 又降于左軍. 賊步騎二萬, 來屯英州城南, 大呼挑戰, 瓘與林彦曰, “彼衆我寡, 勢不可敵, 但當固守而已.” 俊京曰, “若不出戰, 敵兵日增, 城中粮盡, 外援不至, 將若之何. 前日之捷, 諸公不見, 今日亦出死力以戰, 請諸公登城觀之.” 乃率敢死士, 出城與戰, 斬十九級, 賊敗衄奔北. 俊京鼓笛凱還, 瓘等下樓迎之, 携手交拜. 瓘·延寵, 乃率諸將, 會于中城, 大都督府權知承宣王字之, 自公嶮城, 領兵詣都督府, 卒遇虜酋史現兵, 與戰失利, 喪所乘馬, 俊京卽引勁卒, 往救敗之, 取虜介馬以還. 女眞兵數萬, 來圍雄州, 弘正訓勵士卒, 衆皆思鬪, 卽開四門, 齊出奮擊, 大敗之. 俘斬八十級, 獲兵車五十餘兩, 中車二百兩, 馬四十匹, 其餘兵仗, 不可勝記. 時俊京在城中, 州守謂之曰, “城守日久, 軍饗將盡, 外援不至, 公若不出城收兵, 還救城中, 士卒恐無噍類.” 俊京服士卒破衣, 夜縋城而下, 歸定州, 整兵道通泰鎭, 自也等浦至吉州, 遇賊, 與戰大敗之, 城中人感泣. 瓘又城英·福·雄·吉·咸州及公嶮鎭, 遂立碑于公嶮以爲界, 遣其子彦純奉表稱賀曰, “聖人之德, 允合於乾坤, 仁義之兵, 已平其夷狄, 惟將及卒, 旣懽且呼, 竊以東女眞, 潛伏奧區. 寔繁醜類, 遠從爾祖曾之世, 嘗被我朝家之恩, 狼貪浸畜其叛心, 犬吠頻狺於戶外, 侵軼關塞, 寇攘士民. 狃制御之寬而謂之易陵, 肆覬覦之志而謂之莫禦. 先皇故憤以欲伐, 陛下方繼而爲圖, 以兵危故, 始憚裁施, 以謀衆故, 終歸滯泥. 然而策勝負者, 存乎熟, 知變通者, 貴乎時. 事機可乘, 聖智獨照, 先休吾士卒, 以觀其可用, 繼慮彼虛實, 以指其必擒. 乃命元戎, 亟行大戮, 而臣受節鉞之制, 擧征鼓而行. 氣動於軍, 威加於敵, 江河注壑, 寸膠不能以防之, 碬石轉峯, 虛卵決然其破矣, 俘虜踰於半萬, 斬獲近於五千, 委積散於閭閻, 奔走交於道路. 山川險阻, 城池因得以高深, 原野膏腴, 田井亦從而耕鑿, 在昔人求而未得者. 今玆天與而旣取之, 上足以謝宗廟在天之靈, 下足以雪朝廷積年之恥. 且彼周王玁狁之伐, 漢帝凶奴之征, 所以拓土開邊, 而得爲民去害, 比之今日, 宜在下風. 此豈微臣淺智駑材, 能成巨効? 實由陛下聖謀神算, 坐定遐陬, 苟非其然, 孰使之矣? 伏乞命書史冊, 垂耀無窮.” 王遣內侍衛尉注簿康英俊, 賜瓘等羊酒, 幷賜軍人銀鐁鑼一面, 銀甁四十事.
(네이버 백과, 국역 고려사 열전, 1996,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