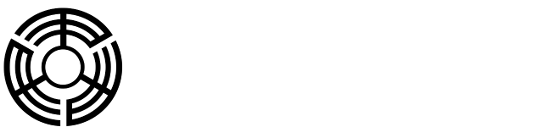신도비명
신도비명 (神道碑銘)
해는 어두운 구름 사이에서 한결 더 빛나고 영웅은 어지러운 시대일수록 더욱 더 우뚝하다. 어허! 역사의 구름을 뚫고 해와 같이 빛나는 민족의 영웅 한 분이 눈부신 업적을 백세에 끼치고 거룩한 뜻과 이름을 천추에 드리운 채 여기 파산(坡山)의 기슭 아래 고요히 잠들어 계시니 이가 바로 저 여진족을 물리치고 동북으로 국토를 널리 열어 거기 아홉 성을 쌓아 겨레의 삶터를 마련하고 나라의 위엄을 떨친 윤관공이시다. 일찍 우리 민족은 아시아의 동방에 나라를 세우고 반만년의 역사를 누려오는 동안 이웃에 있는 강대한 여러 민족과 더불어 피의 항쟁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은 우리는 실로 굴욕을 모르는 민족이어서 남의 침략 앞에 고개를 숙여본 일이 없었고 다시 한편 자유와 정의를 사랑하는 민족이어서 나아가 남을 침략해본 일도 없었다. 여진족은 본시 말갈의 종족들로서 우리 고구려와 발해의 지배 아래서 살더니 고려초엽에 이르러선 차츰 그 세력이 커져 국토의 동북과 서북일대에 퍼져 들어와 자리를 잡고 도리어 고려를 배반하고 침략하기를 시작하므로 덕종 때에는 그들을 막기 위하여 유소(柳韶)를 시켜 천리장성을 쌓게도 하고, 또 문종 때에는 문정 등을 보내어 그들을 무찌르기도 했으나 새로 일어난 완안부 추장 우야소(鳥雅束)가 다시 쳐들어오므로 숙종은 임간 등을 보내어 그들을 섬멸하라 했건마는 불행히 패전하고 돌아왔었다. 몇 날이 지난 뒤 숙종 9년 2월 21일에 왕은 당시 추밀원사(樞密元事)이었던 공으로써 동북면행영병마도통을 삼아 출정케 했으나 공도 역시 전세가 불리하므로 방편상 화의를 맺고 철군할 수밖에 없었다. 공은 돌아와 왕에게 별무반을 조직을 진언하고 여진을 토벌하기 위해 군비를 확충하기에 전력을 기울이니 별무반의 편성 내용은 보직 없는 문무산관과 이서(吏胥)로부터 상고들과 노복들과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말을 가진 사람은 신기군(神騎軍)에 편입하고, 말을 못 가진 자와 또 20세 이상 되는 남자로 과거 안보는 자는 신보군(神步軍)에 입대시키며 또 특과대(特科隊)로 도탕(跳蕩)과 경궁(硬弓)과 정노(精弩)와 발화(發火)등 네 반을 두는 한편 승려로써 항마군(降魔軍)을 만든 것들로 거의 거국적 조직이었던 것이다. 그러는 한편 왕은 천지신명께 고하되, 원컨대 도움을 입어 적을 쓸어버리게 된다면 그 땅에 절을 짓겠나이다. 하며 분한 맹서를 짓더니 원통하게도 큰 뜻을 풀지 못하고 이듬해 10월에 승하하고 그 아들 예종이 뒤를 이었다. 그 또한 선왕의 뜻을 받들어 여진의 동향을 살피기를 게을리 아니하더니 변방 장수로부터 침략의 보고를 받자 분연히 일어나 뜻을 정하고 공으로써 원수를 삼고 오연총으로써 부원수를 삼은 뒤 다시 서경(지금 평양)으로 나가 위봉루(威鳳樓)에서 생살권을 맡기는 도끼를 주어 가게 하니 때는 예종 2년 서기 1107년 12월 1일이었고 병력은 17만 대군이 있었다. 공은 1년을 두고 훈련을 거듭한 정예의 대군을 이끌고 정주(지금 정평)에 이르러 12월 14일로써 전투를 개시했는데 공의 본군과 중, 좌우군, 수군 등 다섯 부대로 나누어 진공하자 적들은 거센 기세에 놀라 모조리 도망하고 가축들만 빈 들판에서 몰려다닐 뿐이었다. 다시 보니 적들이 문내니촌(文乃尼村)(지금 함흥 운홍리 부근)에 이르러 동음성(冬音城)에 들어가 성문을 닫고 숨어 버리므로 공은 특과대의 날랜 부대를 동원하여 성을 깨뜨려 달아나게 하고 또 좌군과 힘을 합해 석성(지금 함흥 고양리 부근)을 쳐서 적의 전부를 섬멸시켰다. 이리하여 고려군대가 여진족들의 촌락을 불사른 것이 135촌, 목 벤 것이 4940명, 사로잡은 것이 1030명에 달했던 바 공은 그것을 조정에 보고함과 동시에 여러 장수들을 파견하여 국경을 확정케 하고 몽라골령(蒙羅骨嶺)아래 영주성을, 화관령(火串嶺)아래 웅주성을, 오림금촌(吳林金村)에 복주성을 궁한이촌(弓漢伊村)에 길주성을 쌓고 다시 이어 영주성안에는 두 절을 지어 숙종의 맹세대로 이뤄 드렸다. 해가 바뀌어 왕의 3년 1월에 공은 8,000명을 이끌고 가한촌(加漢村) 병목 좁은 길을 치다가 우야소(鳥雅束) 무리의 포위를 입어 위태한 고비를 넘기기도 했으며, 적장 알색(斡塞)의 무리들이 기병 2만 명을 이끌고 와서 영주성과 웅주성을 칠적에도 매양 곤경에 빠졌지마는, 그때마다 녹사 척준경의 용맹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것은 특기할만한 일이었다. 3월에는 앞의 네 성과 함주, 공험진 등 여섯 성을 새로 쌓은 뒤에 아들 언순을 보내어 헌공표(獻功表)를 올리고 또 임언을 시켜 영주청벽에 성 쌓은 사실을 적어 붙이게 하는 한편 남방으로부터 무릇 6천4백6십5호의 인민을 옮겨와 거기에 터전을 잡게 하고 또 의주, 통태, 평융등 세 성을 더 쌓아 모두 아홉 성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공에게 추충좌리평융척지진국공신문하시중판상서이부사지군국중사(推忠佐理平戎拓地鎭國功臣門下侍中判尙書吏部事知軍國重事)의 직함을 주고 4월 9일 개경으로 개선했을 때에는, 상하의 온갖 융숭한 환영을 이를 길이 없었다. 돌아온 지 몇 날이 못되어 여진족들이 웅주를 포위하므로, 공과 오연총은 다시 나가 큰 공을 세워, 공에게 영평현개국백(鈴平縣開國伯)을 봉했으며, 이듬해 4년 5월 길주 싸움에서는 크게 이긴 그대로 두만강 건너 선춘령에 비를 세워 여기까지가 고려의 경계라고 큰 글자를 새겨 고려혼(高麗魂)을 외친 이거늘 어찌해 운명의 신은 시기하기 시작하던고, 이때 여진은 아홉 성을 돌려주면 신사백세(臣事百歲)하겠읍니다하고 고려조정에 애원하자 나약하고 공을 질투하는 평장사 최송사등 이십팔인은 9성 반환을 극력 주장하고, 다만 예부의 박승중과 호부의 한상만이 반대할 따름이라 대세는 결정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7월에 철수를 단행했는데 아홉 성중에서 의주, 공험진, 평융진은 빠지고 숭령, 진양, 선화진등 딴 이름이 고려사에 적힌 것은 아마 뒤에 새로 쌓은 것들이리라. 공은 이천리 밖에서 이 명령을 받고 분함을 머금고 회군했는데, 왕은 사신을 보내어 떠날 때 내려준 도끼마저 중도에서 도로 거두어 가는 것이므로, 복명할 겨를도 없이 다만 쓸쓸히 집으로 돌아간 채 공신호조차 삭탈 당했던 것이다. 그 심경 어떠했으랴. 그 위에 금해하는 대신들은 공에게 죄를 주자고까지 했으나, 왕은 듣지 아니하셨다. 한해가 지나 5년 겨울 수태보문하시중판병부사상주국감수국사(守太保門下侍中判兵部事上柱國監修國史)에 임명했으나, 공은 거듭 사양하다가 왕의 뜻을 받들어 전날의 통분을 되새겨 재기의 뜻을 품던 중 이듬해 6년 서기1111년 5월 8일에 말없이 눈을 감으니 향년(享年)61세, 처음 시호는 문경(文敬)이요, 뒤에 문숙(文肅)이라 고치고, 인종 8년에 예종의 사당에 배향하였고, 이조에 와서는 숙종께서 숭의전(崇義殿)에 공을 배향하셨다. 공의 본관은 坡平, 자는 동현(同玄), 호는 묵재(묵齋), 고려 태조의 삼한공신 휘 신달의 5대손으로 부친은 검교소부소감(檢校少府少監) 문정공(文靖公) 휘 집형이었다. 공은 일찍이 젊어서 문과장원에 올라, 습유보궐(拾遺補闕)을 거쳐 송나라에 사신도 갔고, 동궁시강학사어사대부이부상서(東宮侍講學士御史大夫吏部尙書)를 지나 지추밀원사겸한림학사를 역임하며, 평소에 어진 이를 사랑하고 의리를 숭상하여 들어와선 대신이 되고, 나가서는 장수가 되었던 문무를 겸전한 민족의 스승이었다. 그리고 부인은 인천 이씨로서 고려상장군 성간(成幹)의 따님이요, 7남2녀를 낳았는데 1남 언인은 합문지후(閤門祗侯)요, 2남 언순은 남원부사요, 3남 언암과 4남은 출가했으며, 5남 언식은 수사공(守司空)이요, 6남 언이는 정당문학판호병형부사상주국문강공(政堂文學判戶兵刑部事上柱國文康公)이요, 7남 언민은 상의봉어(尙衣奉御)로 서화의 명인이었다. 뒷날 자손들이 번창하여 이제 와서는 남원과 함안과 덕산과 화산 곧 신령 등으로 나뉘었으나, 모두가 문숙공의 후예이니 그야말로 뿌리 깊은 큰 나무인지라 꽃과 열매가 풍성하게 열림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공은 다만 어느 한 가문의 인물이 아니라 민족정기의 표상이었던 분이니, 그러므로 공의 의기는 그대로 민족의 의기요, 공의 한됨은 또한 민족의 한인 것이다. 겨레의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금옥같은 아홉 성을 여진의 갈뢰전(曷賴甸) 땅으로 내어주고, 일세의 개선장군이 하루아침에 패전장의 누명을 쓰게 될 적에 얼마나 분했으랴만, 그것은 결코 개인의 영욕무상이 아니라, 실로 민족사의 방향을 좌우했던 것이다. 간신 배들의 승리는 공을 중심으로 한 당시 화랑계통의 민족노선을 짓밟은 것이니 공의 뜻이 꺾임은 그대로 치솟아 올라가던 민족이상의 탑이 밤새 무너진 것이라, 생각할수록 통분하기 짝이 없거니와, 어찌 천추의 한이란 말로만 그치고 말 것이랴. 9성을 철수한 지 겨우 6년에 완안부 추장 아골타가 일어나 금나라를 세웠거니와, 우리가 그 땅을 지켰던들 거란을 엎지를 자가 저들이 아니요 우리가 아니었겠느냐, 뒷날 세종 때 김종서장군이 경성(鏡城) 서쪽에 있는 승암산(僧岩山) 위에 공을 모시는 사당을 짓고 제사했으며, 그 뒤로는 사당 이름을 호당(芦堂)이라 부르며 향불이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선조 때에는 시중묘(侍中廟)라 사액까지 했으며, 영조께서 분묘에 치제하셨고, 순종께서는 특히 지방관 홍우관을 보내어 공의 무덤에 제사하는 등 역사를 통해 공을 추모하기를 말지 않았음을 보거니와 다시 한번 생각건대 옛날 김장군의 육진 개척도 공의 9성을 다 못 찾은 것임을 보면 9성은 과연 역사적인 장거요, 또 고구려 옛 땅을 되찾을 수 있는 발판이기도 했건만, 슬프다! 꿈은 사라지고 오늘은 그나마 길도 끊어져 소식조차 알 길 없음을 어찌하랴. 이제 나는 옛 터를 찾아와 공의 무덤과 오랜 영정 앞에 머리를 숙여 분향하고, 풍우 속에 흘러간 9백년 세월을 더듬어 공을 그리며, 삼가 노래를 바친다.
갈뢰전(曷賴甸) 눈얼음 박차고 삼군병마를 몰아치던 날 고각(鼓角) 소리 구름을 찢고 오색 깃발 바람에 얼어도 영웅의 불타는 정열에 강산은 되려 훈훈했으리. 두만강 건너 7백리를 달려 선춘령 아래 큰비를 세워, 여기까지가 고려 땅이라 굵은 글자로 새기시고서, 팔 들고 외치시던 님! 그 모습 지금 한번 보고 싶구려, 동북 몇 고을 귀해서리까 대륙 되찾을 발판이었소. 땅 조각 잃은게 분함 아니라, 역사 죽은 게 통분해서요. 세월은 구백 년이나 흘러도 님의 정한은 달랠 길 없소. 이 무덤에 몸을 끼쳐도 혼이사 구성에 가 계시오리, 오늘은 붓을 쥐고 님의 묘비에 글을 쓰오나, 뒷날엔 막대를 던져 북녘 구름을 헤치오리다. 전주후인 이은상(李殷相)글, 20대손 석오(錫五)글씨 1966년 10월 29대손 경수(敬秀)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