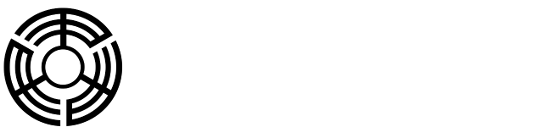중국최고의 字典[자전] 「說文解字[설문해자]」에 희하면 우리 姓字[성자]인 「尹[윤]」자는 又[우]자와 점을 복합시킨 指事文字[지사문자]로서 又[우]는 手[손]을 뜻하고 丿[별]은 사물을 지칭하여 이 둘을 합하여 「손아귀에 정사를 장악하」라는 뜻이 된다.
이리하여 「尹」자는 다스릴 윤(治也), 바를윤(正也), 거느릴윤(主也), 맏윤(昆也), 믿을윤(信也), 성실할윤(誠也), 벼슬윤(官也) 등의 여러 뜻으로 파생하게 된 것이다.
손아귀에 쥔 사물에 대해서는 예복을 입고 朝見[조견]할 때 오른 손에 쥐던 笏[홀] 또는 治者[치자]가 쥐는 筆[붓] 그리고 아버지가 들고 있는 短杖[단장] 등등 諸說[제설]이 있다. 또 고대중국에는 神祇官系統[신기관계통]의 관직에 作冊[작책], 內史[내사] 등이 있어 그 장관을 尹[윤]이라고 호칭한 것으로 보아 「尹[윤]」이란 그 옛날 受靈[수영], 神託[신탁]의 의례를 담당하는 성직자로서 그 손에 쥔 것은 神杖[신장]이라고 보는 설도 있다.
「尹[윤]」자의 뜻을 담은 자로서는 「伊[이]」와 「君[군]」이 있는데 「伊[이]」는 다스린다는 뜻을 가진 尹[윤]자와 人[인]자를 합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성인」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고 「君[군]」은 「尹[윤]」자와 「口[구]」자의 합자로서 백성들에게 호령하면서 다스리는 천자, 군주, 제왕 등의 뜻을 갖는다. 은나라 때에는 탕왕의 정승으로 천하를 잘 다스렸다는 伊尹[이윤]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書傳[서전]에는 伊尹[이윤]이 지었다는 伊訓[이훈]이라는 글이 남아 있다.
「尹[윤]」자가 들어 있는 벼슬 이름도 상당수 있는데 고대중국에서는 재상을 令尹[영윤](論語[논어], 左傳[좌전],史記[사기]) 또는 卿尹[경윤](晋書[진서])이라고 불렀으며 이밖에 尹人[윤인](書傳[서전])은 百官諸侯[백관제후]의 長[장], 尹伯[윤백](書經[서경])은 長官[장관], 箴尹[잠윤](左傳[좌전])은 誎官[속관]의 뜻으로 사용했었다 한다. 우리 世譜[세보]에도 令尹[영윤]이라는 관명이 나오는데 少府公[소부공]의 아드님이 바로 令尹公[영윤공](周輔[주보])이시다.
그런데 삼천년전의 작품까지도 수록되어 있다는 詩傳[시전]의 小雅節南山篇[소아절남산편]에 「尹氏太師維周之氐[윤씨태사유주지저]」 (태사 윤공은 우리나라의 기둥 주춧돌)라는 문구가 있는 것을 보면 중국에서의 윤성의 연원이 매우 유구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