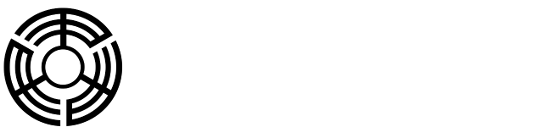시조태사공탄강사
京畿道[경기도] 坡州[파주] 坡平山[파평산] 기슭에는 아득한 太古[태고]부터 큰 연못이 있어 이를 龍淵[용연](一名嘉淵[일명가연])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傳說[전설]에 따르면 이 못속에는 龍人[용인]이 살고 있어 연못가가 불결해지면 雷聲[뇌성]이 진동하고 風雨[풍우]가 몰아친다고 전한다.
옛부터 우리 宗中[종중]에 내려오는 家牒[가첩] 諺傅[언부] 및 그 밖의 文獻[문헌]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一〇八九年[1089년]前[전] 즉 新羅[신라] 眞聖王[진성왕] 7년(西紀[서기] 893년) 癸丑[계축] 음력 8월 15일 龍淵[용연] 위에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요란한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큰 연못위에 한 玉函[옥함]이 떠오르자 마을 사람들이 奇異[기이]하게 여기어 고을 太守[태수]에게 고하여 太守[태수]가 연못가에 나가 보니 玉函[옥함]이 떠올랐다가 연못 복판으로 밀려 들어가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날이 저물 무렵 연못가에서 이날따라 빨래를 하던 한 老婆[노파]가 玉函[옥함]이 다시 떠오르는 것을 보고 이를 건져내어 열어보니 그 속에는 五色[오색]의 羽毛[우모]에 싸여 있는 어린 사내아기가 들어 있었다. 그런데 이 玉函[옥함]에 관해서 일부 문헌에는 石函[석함]이라고 記錄[기록]되어 있고 太師公墓誌[태사공묘지]에는 金櫃[금궤]로 되어 있다.
찬연한 瑞氣[서기]를 발산하면서 玉函[옥함]에서 나온 사내아기는 隆準龍顏[융준용안]으로 코가 우뚝하고 龍[용]의 相[상]을 닮았고, 양쪽 어깨에는 붉은 사마귀가 있어 日月[일월]을 象徵[상징]하고 좌우 겨드랑이에는 비늘 八十一[81]개가 돋아 있으며, 발에 7개의 검은 점이 있어서 北斗七星[북두칠성]의 형상과 같았고, 온 몸에서 광채가 솟아서 눈을 부시게 하였으니 이 어른이 바로 우리 坡平尹氏[파평윤씨]의 始祖[시조]이시다.
그런데 우리 始祖[시조] 太師公[태사공]이 得姓[득성]하신 연유에 관해서 宗中[종중]에서 예부터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龍淵[용연]에서 玉函[옥함]을 건져낸 노파의 姓[성]을 따라 尹姓[윤성]이 되시었다고 전하나 家牒[가첩] 및 그 밖의 문헌에 따르면 玉函[옥함] 자체에 尹字[윤자]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尹姓[윤성]이 되시었다고도 하며, 또한 玉函[옥함]에서 나오실 때 그 어른의 손바닥에 尹[윤]이라는 글씨가 뚜렷이 나타나 있었다고도 전해지고 있다.
玉函[옥함]에서 玉童子[옥동자]로 나오신 太師公[태사공]께서는 노파의 극진한 정성과 사랑으로 양육을 받으시었는데 자라나심에 따라 기골이 장대하시고 才器[재기]가 뛰어나시었다.
太師公[태사공]께서는 坡平山[파평산] 아래에서 사시면서 學問[학문]과 武藝[무예]를 닦으시었는데 坡平山[파평산] 마루에 말이 달릴 수 있는 길을 닦고 弓馬訓練[궁마훈련]을 하시었다.
坡平山[파평산] 마루에서 太師公[태사공]께서 말을 달리시며 武藝[무예]를 연마하시던 곳을 馳馬臺[치마대]라고 하는데 지금도 太師公[태사공]께서 길을 닦으셨던 石築[석축]이 일부 남아 있다.
馳馬臺[치마대]에는 太師公[태사공]께서 訓練[훈련]하시다가 愛馬[애마]가 죽었기 때문에 작은 鐵馬[철마]를 만들어 그곳에 놓아두었는데 후일에 어떤 鐵工[철공]이 그 鐵馬[철마]를 훔쳐갔다가 그만 卽死[즉사]했다는 傳說[전설]이 남아 있다.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두려운 생각이 나서 흑으로 작은 말을 만들어 구워서 그곳에 가져다 놓았다고 전해오고 있으나 지금은 그 형적 마저 없다.
太師公[태사공]께서 學問[학문]을 닦으시던 옛터인 金剛寺[금강사]도 지금은 형적도 없이 자취를 찾아볼 수 없지만 그 寺趾[사지]만은 역역하게 남아 있다.
太師公[태사공]께서 일찍이 坡州[파주]에서 開京[개경]을 매일 臨津江[임진강] 넘어로 來往[래왕]하실 적에 公[공]이 江[강]을 건느실 때에는 으례히 江[강]물이 갈라지며 홀연히 白沙場[백사장]이 드러나서 신발을 적시지 않고 江[강]을 건느시게 되니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겼다는 傳說[전설]이 있다.
또 太師公[태사공]께서는 松都[송도]에 있는 朝廷[조정]에 出仕[출사]하신 뒤에도 말을 타시고 坡平面[파평면]에 있는 私邸[사저]에서 강 넘어로 來往[래왕]하시었는데 말이 빠르기가 나는 듯 하였고 江[강]을 건널 때에는 물이 양쪽으로 갈라졌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世人[세인]들은 물결 끊고 마시듯 강을 건넜다 하여 이곳을 如飮津[여음진]이라고 이름 지었다가 후에 飮津[음진]으로 고치었는데 이것이 다시 後世[후세]에 와서는 音[음]이 변하여 臨津江[임진강]이 되었다고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