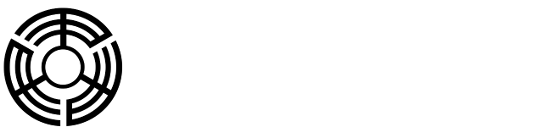문숙공 묘표
우리 선조 고려태보 시호는 문숙공(文肅公)이오 휘는 관(瓘)이오 자는 동현(同玄)이오 관향은 파평(坡平)이시다. 공훈이 삼한에 덮히고 명성이 백대까지 미치시니 그 산소도 마땅히 후세에 나타내서 후손으로 하여금 향을 올리게 하고 지나는 사람들도 공경하게 하는 것이 천도와 신의 도리에 당연한 일이거늘 세대가 점점 멀어지자 남들이 침식해 들어와 장사지내게 되어 옛날 자리를 살필 수가 없으니 우리 종족의 통한하고 아프기가 수백년 동안을 하루같이 하였었다. 그러더니 이제 21대손 면교(勉敎)가 여러 종인과 더불어 방편을 마련하여 산소자리를 찾아내고 그 봉축한 것을 다시 개축하여 선세를 추모하니 일이 비로소 자리가 잡혔다고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진실로 우리 후손들이 더 할 수 없는 큰 경사이다. 이 어찌 우리 선조의 혁혁하신 영혼이 어둡지 않게 계셔서 음으로 도우신 바가 있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공의 고조의 휘는 신달(莘達)이시니 고려태조를 도와서 우리나라를 통일하여 벽상공신으로 책록되시고 벼슬은 태사(太師)이시니 우리 시조가 되시고 증조의 휘는 선지(先之)이시니 역시 벽상공신이시고 조부의 휘는 금강(金剛)이시니 벼슬이 상서좌복야이시고 고의 휘는 집형(執衡)이시니 벼슬은 검교 소감이신데 증직이 우복야이시고 시호는 문정공이시다. 공이 일찍이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벼슬이 호화스러우시고 여러번 옮겨서 이부상서 한림학사 승지에 이르시고 숙종10년에는 참지정사 한림원판사 태학사까지 되셨다. 이때 여진족이 북방에서 노략질 해 온지가 오래였다. 예종초에 정주에서 비적이 소란을 부려 관문(나라의 출입구)의 형세가 심히 막히니, 이에 공을 명하여 도원수로 삼고 오연총을 부원수로 삼아서 부월(살생의 권한을 부여하는 도끼같은 증표)을 주어 보내니 공이 드디어 군사를 이끌고 북으로 가서 오랑케 고장까지 쳐 들어가서 적을 만나 크게 부수고 또 금성에 이르러 부수고, 또 석성에 이르니 적들이 달아나서 험지를 의지하여 굳게 지키니 군사들이 막히어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공이 장수들을 격려하여 좌우로 협격하여 대파해서 하루도 안 되어서 두 성을 무찔러 버렸다. 또 모든 장수들을 시켜서 모든 통로를 막게 하고 나누어서 공격하여 에워들어 잡아서 육천여명을 베이니 모든 군사들의 기세가 살아나고 부러진 칼과 힘없는 무리들이 우수수 쏟아지듯 하니 적들이 기운이 죽어 소리치고 도망하고 달아나서 궁지에 빠지고 패하고 활과 칼을 거두고 진 앞에 항복하는 자가 또한 속출하더라. 공이 스스로 노포(露布=승전하고서 그 공훈서를 조정에 올리는 것)를 만들어 하례하니 왕이 글을 내려 포상하고 고유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황하 물이 구렁에 치닫는데 한치의 푸레를 가지고 능히 막아낼 수가 없고 돌덩어리가 산봉우리에서 굴러 내리는데 속이 빈 알이 틀림없이 깨어질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귀가 웅장하고도 굳세어서 사람들이 지금껏 전하여 외우고 있다. 땅 칠백여리를 개척하였고 아홉 개의 성을 쌓고 국경에 경계 빗돌을 세우니 왕이 공을 책록하여 「추충좌리 평융척지 진국공신」을 삼고 「문하시중 지군국중사」를 배수하고 개선하여 돌아오는데 악대를 갖춘 군대로써 호위해 맞이하고 교외에서 위로의 잔치를 베풀게 하였다. 그 후 얼마 아니해서 여진족이 또 쳐들어오니 공을 보내어 치게 하고 귀 베인 것을 받치자 영평현 개국백으로 더하여 봉하고 실봉으로 삼백호를 채식케 하고 또 「태보 상주국 감수국사」를 배수하고 돌아가시니 시호를 문경(文敬)이라 하였다가 뒤에 수릉(綏陵)의 휘호를 피하여 지금의 시호 문숙(文肅)으로 고치게 되었다. 공이 어려서 학문을 좋아하여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진중에서도 오경을 휴대하였다. 후진들이 재주와 학문이 있는 이가 있으면 칭찬하기를 좋아하시니 이러므로 어진 이를 좋아하는 것이 당시에 제일이었다. 예종의 사당에 배향되시고 조선조에 또한 숭의전에 배향되셨다. 아들은 여섯인데 맏아들 언인(彦仁)은 벼슬이 지후(祗候)이니 그 후손들은 남원(南原)과 함안(咸安)의 두 본으로 나누어서 대대로 계승되어 오고 여섯째 언이(彦頤)는 벼슬이 정당문학(政堂文學)이요 시호는 문강(文康)이니 지금 파평으로 관향을 한 사람은 모두 그 후손이다. 공의 공훈에 이미 나타나고 복택이 먼데까지 미쳐서 안팎 자손이 번성하고 귀하고 현달해서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리고 네 번이나 사록과 경사(왕비를 탄생하는 경사)가 있어 성인(임금의 존칭)을 탄생하여 동방의 억만 세대에 이어가는 기업이 왕성하였는데야 더 말할 수가 있겠는가? 산소는 파평 분수원의 북쪽에 있는데 보책과 여지승람에 실려 있고 그곳 백성들도 문숙공 알기를 군졸들이 사마(군사를 맡아 보는 벼슬)를 알 듯 하였는데 모두 문숙공의 산소가 심가 무덤 있는 산에 있다고 말하였다. 심가 무덤 밑에 묵은 묘 하나가 있는데 뒤에 굽은 담이 있고 앞에 돈대 하나가 있는데 역시 이르기를 윤시중의 교자총이라 하니 우리 종인으로 산 밑을 지나가는 이 마다 가리키면서 슬프게 느낀지가 오래이다. 그 후 홀연히 이씨라는 자의 비가 무덤 앞에 서 있으니 이는 전에 없던 것이 생긴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의혹하게 하고 우리 종중과 심씨가 서로 힐난하여 임금의 귀에까지 들으시게 되니 임금께서 바로 가까이 뫼시는 사람을 보내어 그 사실을 조사하라 하시고 따라서 교시를 내려 말하기를 「칠백년 묵은 옛 무덤에 만일 비가 있었다면 사람들이 누가 보지 않았겠는가? 이제 세웠으니 하늘이 세운 것이냐? 아니면 귀신이 세운 것이냐?」하니 사람이 알아듣기에 어렵지 않았다. 산소 앞에 작은 개울에서 비 하나를 주었는데 비록 부러지고 긁히고 깨어지기는 하였으나 공훈의 호와 벼슬과 시호와 성자가 완연하게 읽을 수가 있었다. 그러하되 심씨는 오히려 다시 서로 논란하여 두 집이 거듭 부르짖으니 임금이 또 교시하여 말하기를 「옛 정승이 아신다면 마음이 어찌 편할 수 있겠는가? 자손 된 자가 그 조상으로 하여금 신령을 편안히 못해 드리면 어찌 사람의 도리이겠는가? 만일 이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 마땅히 엄하게 처벌할 것이다.」하고 친히 글을 지어서 가까운 신하를 보내어 공의 산소에 제를 드리게 하였다. 제문에 이르기를 「공의 무덤이 어디에 있느냐? 분수의 북쪽이로다. 세상에서 일컫는 교자 무덤은 산소 영역의 곁이로구나. 하늘이 도가 밝고 밝아서 빛나는 해와 같도다. 슬픔이 일어남을 깨닫지 못하여 이에 수축할 것을 명한다」하였다. 그런데도 그 수축함에 있어서 심가들이 오히려 희미한 것을 잡고 어지러움을 일으키니 임금께서 성이 난듯하여 친히 물으시니 심정최가 비를 묻은 일과 다른 묘의 돌을 옮겨 세운 사실을 아뢰었다. 그런 즉 충성치 못하고 효성스럽지 못한 교훈이 있었으니 심하다. 심씨의 모양스럽지 못함이여! 심씨가 우리 윤씨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심씨도 또한 스스로 말하면서 도리어 차마 이런 짓을 하느냐? 심씨 무덤을 오히려 옮기지 아니하여 묘가 가까워서 수축하는 데에 모습을 갖추지 못하겠으니 어찌 아프지 않겠는가? 슬프다! 공이 조정에 벼슬하여 산소가 수백년이 지난 뒤에 우리 임금께서 오랜 옛날 것에 감동을 일으켜서 이미 묘를 수축하라 명하시고 또 친히 글을 만들어서 제사하시니 공의 위대한 업적이 다시 나타나고 이미 잃었던 산소자리가 다시 드러나시니 임금의 글이 빛나기가 별과 해가 걸려 있듯 밝아 후손이 감동하고 칭송함이 하해와 같아서 헤아릴 수가 없노라. 문강공의 산소는 보첩에 역시 이르기를 「지금 심정승 지원의 산지가 되었다.」하였는데 아직도 찾을 수가 없으니 이는 곧(자손의) 성의가 미치지 못하고 인력으로 다하지 못한 것이다. 모든 우리 종중 후인들은 마땅히 명심할 것이다. 이제 장차 우선 표석부터 세우려는데 모든 종인들이 종중에 모여 의논해서 영부사 동도(東度)로 하여금 봉구(鳳九)에게 돌에 실릴 글을 위촉하니 봉구가 오랫동안 글이나 글씨를 폐한 뒤에 받아서 선세를 추모하는데 효력이 있는 것이니 이것을 버리고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러기에 삼가 행장과 전기에 의해서 거두어서 글을 만들었다. 그러나 다른 데는 문헌이 가히 증거 할만한 것이 없고 평소의 문장과 사업과 공적은 만분의 하나도 칭찬할 수가 없었노라. 승정원기원후 셋째 병술(丙戌) 월 일 21대손 정헌대부전공조판서겸세자시강원찬선 鳳九는 삼가 찬한다. 22대손 가선대부사헌부대사헌겸동지춘추관사 東暹은 삼가 전면을 쓰다. 22대손 통정대부사간원대사간겸지제교 坊은 삼가 후면을 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