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사 열전 (윤인첨, 윤세유, 윤상계) | |
| root | 2020.08.31 03:07 | |
|
鱗瞻, 字胎兆, 登第, 毅宗朝, 累遷侍御史. 言事忤權貴, 降授左司員外郞, 轉起居注. 時宮人無比, 得幸於王, 生三男九女, 崔光鈞爲無比女壻, 因緣內嬖, 超授八品, 兼式目錄事, 士夫莫不切齒. 諫官不署光鈞告身, 王召鱗瞻及諫議李知深, 給事中朴育和, 司諫金孝純, 正言梁純精·鄭端遇, 督署之. 郞舍畏縮, 唯唯而退, 有人嘲之曰, “莫說爲司諫, 無言是正言, 口吃爲諫議, 悠悠何所論.”
윤인첨(尹鱗瞻)은 자가
태조(胎兆)이며, 과거에
급제한 뒤 의종 때 여러 차례 전임하여 시어사(侍御史)가
되었다. 어떤 일에 대해 말했다가 권세가의 비위를 거슬러 좌사원외랑(左司員外郞)으로 강등되었다가 기거주(起居注)로
옮겼다. 당시 궁인(宮人)
무비(無比)가 왕의 총애를 받아 3남 9녀를 낳았다는데 무비의 사위인 최광균(崔光鈞)은 자기 장모가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기회 삼아 8품으로 뛰어넘어 임명되고 식목녹사(式目錄事)를 겸하니 사대부들은 다들 이를 갈며 미워했다. 간관(諫官)들이 최광균의 직첩에 서명하지 않자 왕은 윤인첨 및 간의(諫議) 이지심(李知深), 급사중(給事中) 박육화(朴育和), 사간(司諫) 김효순(金孝純), 정언(正言) 양순정(梁純精)·정단우(鄭端遇)를 불러
서명을 독촉했다. 낭사(郞舍)들이 겁에 질려 그저 예 예 하면서 물러가자 어떤 사람이 그들을 두고 조롱하는 시를 지었다. “말하지 않는 자가 사간이 되고, 말 없는 자가 바로 정언이구나. 말더듬이가 간의가 되었으니, 무위도식하는 자들이 무슨 비판을 하겠노. 後以刑部侍郞, 出爲西北面兵馬副使. 麟·靜二州境有島, 金人多來居. 兵馬副使金光中擊逐之, 置防戍, 金主詰讓. 王命還其島, 撤防戍, 鱗瞻等恥削土, 不從. 金大夫營主遣銳卒七十餘人, 攻其島,
執防守別將元尙等十六人, 以歸. 鱗瞻懼, 與義州判官趙冬曦密謀, 移牒請還俘獲,
翼日, 還之, 鱗瞻等秘不奏, 國家知而詰之, 鱗瞻畏罪彌縫, 竟不報. 入爲右諫議大夫.
윤인첨은 그 후 형부시랑(形部侍郞)이
되었다가 서북면병마부사(西北面兵馬副使)로 나갔다. 인주(麟州 : 지금의
평안북도 의주군)와 정주(靜州 : 지금의 평안북도 의주군 고성)의 경계에 섬이 있는데 금나라 사람이
많이 이주해 살고 있었다. 병마부사(兵馬副使) 김광중(金光中)이 공격하여
쫓아내고 수자리를 설치하자 금나라 임금이 잘못을 따지며 꾸짖었다. 왕이 그 섬을 돌려주고 수자리를 없애라고
지시했지만 윤인첨 등은 영토를 빼앗기는 것을 수치로 여겨 복종하지 않았다. 이에 금나라의 대부(大夫) 영주(營主)가 정예병 70여 명을 보내 그 섬을 습격하고 방수별장(防守別將) 원상(元尙) 등 16명을 사로잡아 돌아갔다. 당황한
윤인첨이 의주판관(義州判官) 조동희(趙冬曦)와 몰래 의논한 후 공문을 보내 잡아간 사람들을 돌려 보내달라고
요청해 다음날 돌려받았으나 윤인첨 등은 그 사실을 숨기고 보고하지 않았다. 조정에서 알고 따져 물었으나
윤인첨은 처벌당할 것이 겁이 나 우물쭈물하면서 끝내 보고하지 않았다. 그 뒤 내직으로 돌아와서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가 되었다.
明宗立, 授國子監大司成, 驟陞叅知政事判兵部事, 進中書侍郞平章事, 出爲東北面兵馬判事行營兵馬兼中軍兵馬判事. 金甫當起兵, 李義方疑鱗瞻與知其謀,
又以爲當時文臣之長, 將逮捕害之, 使巡檢軍, 執縛鱗瞻, 賴庾應圭獲免. 尋兼上將軍, 叅署重房議事, 加守太師.
명종이 즉위하자 국자감대사성(國子監大司成)으로 임명되었다가 곧이어 참지정사(叅知政事)·판병부사(判兵部事)에
올랐고,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로 승진하여 동북면병마판사(東北面兵馬判事)·행영병마(行營兵馬) 겸
중군병마판사(中軍兵馬判事)로 나갔다. 김보당(金甫當)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의방(李義方)은 윤인첨이 진작 그 모의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또한 그가 당시 문신들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해 잡아서 죽이려고 순검군(巡檢軍)을 시켜 윤인첨을 체포하게 하였으나 유응규(庾應圭)의 힘으로 죽음을 면했다. 이어서
상장군을 겸하여 중방(重房)의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수태사(守太師)로 승진하였다. 趙位寵起兵, 王命鱗瞻爲元帥, 率三軍擊之. 至岊嶺驛, 會大風雪, 西兵從嶺而下, 急擊之, 官軍亂, 遂奔潰. 鱗瞻被圍, 欲與敵戰死, 都知兵馬使鄭筠, 止之曰, “主將不宜自輕.” 遂撾鱗瞻馬, 潰圍突出, 僅免, 收兵而還.
조위총(趙位寵)이 반란을
일으키자 왕은 윤인첨을 원수로 임명해 삼군(三軍)을 거느리고
진압하게 하였다. 관군이 절령역(岊嶺驛)에 이르자 마침 눈보라가 휘몰아쳤는데 이를 틈타 서경 군사들이 고개에서 내려와 급습하니 관군은 혼란에 빠져 마침내
궤멸되었다. 포위당한 윤인첨이 적과 싸우다 죽으려 하자, 도지병마사(都知兵馬使) 정균(鄭筠)이 “지휘관이 경솔히 행동해서는 안됩니다.”고 만류하면서, 윤인첨의 말을 채찍질하여 포위를 무너뜨리고 빠져
나와 겨우 죽음을 면하고 군사를 거두어 돌아왔다. 尋又以鱗瞻爲元帥, 樞密院副使奇卓誠副之, 知樞密院事陳俊爲左軍兵馬使, 同知樞密院事慶珍爲右軍兵馬使, 上將軍崔忠烈爲中軍兵馬使, 攝大將軍鄭筠知兵馬事, 上將軍趙彦爲前軍兵馬使, 攝大將軍文章弼知兵馬事, 上將軍李齊晃爲後軍兵馬使, 司宰卿河斯淸知兵馬事, 復攻西京, 僧軍亦行.
이어 윤인첨을 원수로 삼고,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기탁성(奇卓誠)을 부원수(副元帥), 지추밀원사(知樞密院事) 진준(陳俊)을 좌군병마사(左軍兵馬使), 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 경진(慶珍)을 우군병마사(右軍兵馬使), 상장군
최충렬(崔忠烈)을 중군병마사(中軍兵馬使), 섭대 장군(攝大將軍) 정균을 지병마사(知兵馬使), 상장군
조언(趙彦)을 전군병마사(前軍兵馬使), 섭대 장군 문장필(文章弼)을
지병마사, 상장군 이제황(李齊晃)을 후군병마사(後軍兵馬使), 사재경(司宰卿) 하사청(河斯淸)을 지병마사(知兵馬使)로
각각 임명해 다시 서경(西京)을 공격하게 했는데 승군(僧軍)도 참여했다. 鱗瞻率諸將, 治兵西郊, 筠密誘僧宗旵斬義方. 王慮軍中驚擾, 遣近臣庾應圭諭之, 軍中皆疑文臣嗾僧軍爲變, 欲殺鱗瞻. 應圭還告鄭仲夫, 遣人諭解, 乃止. 僧軍以爲義方女不宜配東宮, 請出之, 遂聚普濟寺, 不發, 鱗瞻等乃行.
윤인첨이 장수들을 거느리고 도성 서쪽 교외에서 군사를 점검하고 있는 동안 정균이 은밀히 승려 종참(宗旵)을 꾀어 이의방(李義方)을 죽여 버렸다. 왕은 군중(軍中)에서 동요가 일어날까 우려해 근신(近臣) 유응규(庾應圭)를 보내어
무마하게 했는데 군중에서는 다들 문신들이 승군을 사주해 변란을 일으킨 것으로 의심해 윤인첨을 죽이려고 하였다. 유응규가
돌아와 정중부(鄭仲夫)에게 알리자 정중부가 사람을 보내어
설득했더니 그제서야 소란이 가라앉았다. 승군은 이의방의 딸이 동궁(東宮)에게 배필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쫓아내라고 요구하면서 보제사(普濟寺)에 집결한 채 출발하지 않으므로 윤인첨 등은 그들을 남겨둔 채 출정했다. 位寵腹心在漣州, 鱗瞻謂諸將曰, “我聞招携者附于內, 伐叛者披其枝. 若我先攻西京, 則在漣州者招諭北人, 共爲掎角. 我腹背受敵, 非策之善也. 今漣州恃西都, 不虞我猝至, 宜先攻漣州. 漣州若下, 北州諸城, 必皆歸順. 然後率順攻逆, 則意全力一, 蔑不濟矣.”
당시 조위총의 심복들이 연주(漣州
: 지금의 평안남도 개천시)에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윤인첨은 장수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내가 듣건대 다독거려 이끌고 가야할 사람은 내적으로 밀착해야 하고, 반역자를
토벌할 때는 먼저 그 일당부터 처치하는 법이라고 한다. 만약 우리가 먼저 서경(西京)을 공격하면 연주에 있는 자들이 북인(北人)을 불러서 우리를 협공할[掎角]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앞과 뒤로 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니 이는
좋은 작전이 아니다. 지금 연주는 서도(西都)를 믿고 우리가 갑자기 공격해 오리라고 우려하지 않을 것이니 먼저 연주를 쳐야만 한다. 연주가 함락되면 북주(北州)의
여러 성은 반드시 모두 귀순할 것이다. 그런 뒤에 귀순한 자들을 거느리고 역적들을 치면 마음이 모이고
힘이 하나가 되어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遂趣漣州, 攻圍累月, 漣州請救於位寵. 位寵遣將救之, 官軍從閒道擊之, 斬一千五百餘級, 虜二百二十餘人. 官軍又遇西兵于莽院,
掩擊之, 斬七百餘級, 虜六十餘人. 漣州久不下, 後軍摠管杜景升攻拔之,
於是, 西北諸城, 皆復迎降. 遂移師攻西京, 鱗瞻曰, “西京城險固, 若以久勞之卒, 蟻附而攻, 非計也. 但久圍之, 無使出掠, 且復招懷, 開示生路, 則城中被劫者, 必謀出降. 若爾, 位寵乃一餓囚耳, 何能爲乎.”
드디어 연주로 가서 여러 달을 공격하고 포위하였더니 연주가 조위총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조위총이 장수를 보내어 구원하였는데 관군이 사잇길에서 공격하여 1천 5백여 명을 베고 220여 명을 사로잡았다. 관군은 다시 서경 군사들을 망원(莽院)에서 마주친 서경군을 습격하여 7백여 명을 베고 60여 명을 사로잡았다. 연주가 오랫동안 항복하지 않자 후군총관(後軍總管) 두경승(杜景升)이 공격하여 함락시키니, 그제서야 서북의 여러 성이 모두 투항해왔다. 드디어 군사를 이동시켜 서경을 공격하게 되자, 윤인첨이 다음과 같이
전략을 제시했다. “서경은 성이 험하고 견고하니 오랫동안 피로해진 군사로 개미떼처럼 붙어서 공격하는
것은 좋은 작전이 아니다. 장기간 성을 포위하여, 적들이
성 밖으로 나와 노략질만 못하게 하는 한편 그들을 진무하고 살길을 열어 보여주면, 성 안에서 협박을
당한 자는 반드시 나와서 항복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조위총은 결국 한 굶주린 죄수 신세가 되어
꼼짝달싹 못하게 될 것이다.” 乃於城東北, 築土山守之, 位寵食盡至啗人屍, 時出挑戰, 鱗瞻堅壁不出. 有擒獲者, 輒與衣食而遣之, 城中聞之, 縋城來附者甚衆. 旣而官軍又與西兵戰, 大敗之, 斬獲三十餘, 取其要害鳳凰頭, 城之.
이 전략에 따라 관군은 성의 동북쪽에 토산(土山)을 쌓아서 수비했다. 양식이 다 떨어져 사람의 시체를 먹게 되자 반군은
때때로 나와서 도전했으나 윤인첨은 수비를 굳게 할 뿐 싸움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사로잡은 자에게 곧바로
입을 것과 먹거리를 주어 보내었더니, 성 안에서 이 사실을 듣고 성을 타고 내려와서 투항해오는 자가
매우 많았다. 얼마 후 관군은 다시 서경군과 싸워 대패시키고 30여
명을 죽였으며 요해처인 봉황두(鳳凰頭)를 빼앗아 성을 쌓았다. 六年鱗瞻攻西京通陽門, 景升攻大同門,
破之. 城中大潰, 擒位寵殺之, 囚其黨十餘人, 餘皆撫慰, 居民按堵如故. 謁聖祖眞殿, 函位寵首, 遣兵馬副使蔡祥正告捷. 又送位寵妻孥及俘獲百餘人, 梟位寵首于市. 先是, 鱗瞻忽聞西兵讙噪城上, 問之. 云, “人呼立龍而賀之.” 鱗瞻曰, “位寵將死矣, 去人與頭, 豈可生乎?”
명종 6년(1176) 윤인첨은
서경의 통양문(通陽門)을 공격하고, 두경승은 대동문(大同門)을
공격하여 격파했다. 성 안이 완전히 궤멸되자 조위총을 잡아 죽이고 그 일당 10여 명을 가두면서 나머지는 모두 잘 다독거리니 서경의 거주민들이 예전처럼 안도하게 되었다. 윤인첨이 태조 진전(眞殿)을
참배한 후 조위총의 머리를 함에 넣어 병마부사(兵馬副使) 채상정(蔡祥正) 편에 보내고 승전을 보고했다. 또 다시 조위총의 처자 및 포로 1백여 명을 보내니 조정에서는 조위총의
머리를 큰 거리에 전시했다. 함락에 앞서 윤인첨이 서경 군사들이 갑자기 성 위에서 무어라 떠드는 소리를
듣고 연유를 물었다. 서경 사람들이 용(龍)을 세웠다고 외치면서 이것을 축하하는 것이라고 하니, 윤인첨은 “조위총이 죽겠구나. (位寵에서) 인(亻)과 머리[宀]를 버렸으니 어찌 살겠느냐.”라고 말했다. 鱗瞻遣秘書少監庾世績, 表賀平西, 王遣吏部侍郞吳光陟, 詔班師. 加鱗瞻推忠靖亂匡國功臣上柱國監修國史, 遣叅知政事陳俊, 迓勞諸將于金郊驛.
復遣介第平涼侯, 賜宴于馬川亭, 及還, 又賜宴以勞之. 是年卒, 年六十七, 謚文定, 官庀葬事.
윤인첨이 비서소감(書少監) 유세적(庾世績) 편에 표문을 올려 서경 평정을 하례하니, 왕이 이부시랑(吏部侍郞) 오광척(吳光陟)을 보내 군사를 이끌고 돌아오라는 조서를 내렸다. 윤인첨에게 추충정란광국공신(推忠靖亂匡國功臣)·상주국(上柱國)·감수국사(監修國史)를 덧붙였으며, 참지정사(叅知政事) 진준(陳俊)을 시켜 장수들을 금교역(金郊驛 :
지금의 황해북도 금천군 강음)에서 영접하게 했다. 또한
왕의 동생인 평량후(平凉侯)를 보내어 마천정(馬川亭)에서 잔치를 베풀어주었고, 귀환하자
다시 잔치를 베풀어서 위로하였다. 이 해에 죽으니 나이 67세였다. 시호를 문정(文定)이라
하고 관청에서 장례를 치러 주었다. 鱗瞻聰悟過人, 雖千百人, 一聞姓名, 終不忘. 自鄭仲夫作亂, 文臣沮喪, 鱗瞻與武臣同事, 每被掣肘, 脂韋自保而已. 故平西之後, 賞罰不中, 措置失宜, 致使西北降附之民屢叛, 物議少之. 後王下制曰, “往者趙位寵叛於西都, 元帥尹鱗瞻·奇卓誠等, 同心協力, 以討平之, 予嘉厥功曰, ‘篤不忘’, 其贈鱗瞻, 推忠靖亂匡國功臣, 守太師門下侍中上柱國, 圖形閣上.”
後配享明宗廟庭.
윤인첨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총명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한번 그 이름을 들으면 끝까지 잊지 않았다. 정중부(鄭仲夫)의 변란
이후 문신이 힘을 잃자 윤인첨이 무신들과 함께 일을 했는데 매사에 견제를 당한 나머지 적당히 타협하며 자신을 보존해나갈 뿐이었다. 그러므로 서경을 평정한 뒤로 상벌이 공평하지 않고 일의 처리가 적절하지 못해 투항한 서북 백성들이 여러 차례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윤인첨을 비난했다. 뒤에 왕이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과거 조위총이 서도(西都)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원수 윤인첨과 기탁성(奇卓誠) 등이 한
마음으로 협력해 토벌 평정했기에, 내가 그 공을 가상히 여겨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 윤인첨에게는 추충정난광국공신(推忠靖亂匡國功臣)·수태사(守太師)·문하시중(門下侍中)·상주국(上柱國)의 칭호를 덧붙이고 공신각에 초상을 걸도록 하라.” 뒤에 명종의 묘정에 배향하였다. 子宗諤·宗誨·宗諴·宗諹. 宗諤以大府注簿, 死於仲夫之亂, 宗誨蔭進判禮賓省事, 宗諹刑部侍郞. 鱗瞻, 兄弟三人登第, 宗諤·宗誠·宗諹, 又登第, 再世廩母. 時人榮之, 里閭號其家爲三第宅, 又號爲二帥宅.
宗諹重然諾喜施與, 然廣植田園, 多受饋遺, 爲世所譏.
아들은 윤종악(尹宗諤)·윤종회(尹宗誨)·윤종함(尹宗諴)·윤종양(尹宗諹)이다. 윤종악(尹宗諤)은 대부주부(大府注簿)로 정중부(鄭仲夫)의 난 때 죽었고, 윤종회(尹宗誨)는 음서로 판예빈성사(判禮賓省事)에
임명되었고, 윤종양은 형부시랑(刑部侍郞)이 되었다. 윤인첨의 형제 세 명이 과거에 급제하고 윤종악(尹宗諤)·윤종함(尹宗諴)·윤종양도 과거에 급제하여 두 대에 걸쳐 그 모친에게 녹봉을 주게 되었다. 당시에
그 일을 영예롭게 여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을 삼제댁(三第宅) 혹은
이수댁(二帥宅)이라고 불렀다. 윤종양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베풀어 주기를 좋아했으나, 전원을
넓게 만들고 보내오는 물건을 많이 받았으므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 世儒, 瓘之孫, 熙宗時, 爲右御史. 一日, 王移御延慶宮, 世儒與左御史崔傅, 當扈駕. 二人凌晨詣闕, 日將晡, 乘輿未駕, 飢甚, 入路傍家飮酒, 不覺駕出. 傅犯馳道, 世儒泥醉, 使人控馬, 言語狂亂. 憲府劾奏, 左遷傅安東判官, 世儒梁州副使. 其後世儒荅傅賀冬至狀云, “駕後一樽, 二人同醉, 嶺南三載, 千日未醒.”
윤세유(尹世儒)는 윤관(尹瓘)의 손자로 희종 때 우어사(右御史)가 되었다. 하루는 왕이 연경궁(延慶宮)으로 행차하자 윤세유가 좌어사(左御史) 최부(崔傅)와 함께 어가를
수행하게 되었다. 두 사람이 새벽에 대궐로 갔는데 저녁 때가 다 되어도 어가가 출발하지 않기에 시장한
나머지 길 가의 집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어가가 출발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최부는 왕이 가는 길에
뛰어들었고, 윤세유는 엉망으로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을 잡게 했으며 제멋대로 횡설수설했다. 이일로 헌부(憲府)의
탄핵을 받아 최부는 안동판관(安東判官)으로, 윤세유는 양주부사(梁州副使)로
좌천되었다. 그 후 윤세유는 최부가 쓴 「하동지(賀冬至)」 시에 이렇게 화답했다. “어가를 따르며 술 한 잔에, 두사람 함께 취했었지. 영남 땅에 온지 삼년에, 천 날 지나도록 아직 술 깨지 않았네.” 高宗初, 拜禮部員外郞, 謁崔忠獻, 請命題賦詩. 忠獻召李奎報·陳澕·僧惠文, 同賦觀碁詩四十餘韻, 使翰林承旨琴儀考閱, 奎報爲首, 澕次之. 世儒, 自見忠獻, 得意猖狂, 期於柄用. 素與右僕射鄭稹有憾, 誣告於王曰,
고종 초 예부원외랑(禮部員外郞)으로
임명되어 최충헌(崔忠獻)을 접견한 자리에서 그에게 시제(詩題)를 내어 시를 짓게 하라고 청하였다. 이에 최충헌이 이규보(李奎報)·진화(陳澕)·승려 혜문(惠文)을 불러 함께 ‘관기시(觀碁詩)’ 40여 운을 짓게 하고, 한림승지(翰林承旨) 금의(琴儀)를 시켜 품평하게 했는데, 이규보가 으뜸이었고 진화가 그 다음이었다. 윤세유가 최충헌을 만나고부터 득의만만하게 미쳐 날뛰며 요직에 기용되기를 바랐다. 평소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 정진(鄭稹)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왕에게 이렇게 무고하였다. “稹與弟樞密叔瞻, 將圖不軌, 若以臣爲校定別監, 付以一番巡檢, 則可掃除矣.” 王驚愕, 遣承宣車倜, 密諭忠獻, 執世儒鞫之, 依違如醉, 未能出語. 遂坐誣配島, 尋召還, 道死. 世儒, 以文學名世, 喜酒色, 朝政有不稱意者, 輒托詩謗訕, 時號狂人.
“정진이 그 동생인 추밀(樞密) 정숙첨(鄭叔瞻)과 함께 반역을 도모하려 하니, 만약 신을 교정별감(校定別監)으로
임명해 일번(一番) 순검(巡檢)을 딸려 주신다며 역도들을 쓸어 없애 버릴 수 있습니다.” 놀란 왕이
승선(承宣) 차척(車倜)을 시켜 몰래 최충헌에게 알려 윤세유를 체포해 심문하게 했는데, 술에
취한 것처럼 우물쭈물하며 횡설수설했다. 결국 무고죄로 섬으로 유배보냈다가 얼마 뒤에 소환하였으나 도중에
죽었다. 윤세유는 문학으로 세상에 이름이 났으나 주색을 좋아하고 조정의 정사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바로 시를 지어 비방하니 당시 사람들이 미치광이라고 하였다. 商季, 字受益. 質直無華, 淸謹有幹局. 由門蔭顯, 所莅有聲績. 神宗四年, 以西京副留守卒. 曾孫珤, 官至僉議政丞致仕, 忠肅十六年卒, 謚文顯. 子安庇·安肅·安.
윤상계(尹商季)는 자가
수익(受益)이다. 성격이
질박하고 곧으며 꾸밈이 없고 청렴 근신했으며 재능과 도량도 갖추었다. 문벌 출신이라 음서로 현달하였으며
가는 곳마다 명성과 공적이 있었다. 신종 4년(1201) 서경부유수(西京副留守)로
죽었다. 증손 윤보(尹珤)는
첨의정승(僉議政丞)까지 지내다 은퇴했으며 충숙왕 16년(1329)에 죽자 시호를 문현(文顯)이라 하였다. 아들은
윤안비(尹安庇)·윤안숙(尹安肅)·윤안척(尹安䙗)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역
고려사 열전, 1996,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인용 |
|
| 이전글 | 집의공(執義公) … | 관직관련 상식 | 다음글 |
26개의 댓글
*1
*1
*1
*1
-1 OR 2+155-155-1=0+0+0+1
-1 OR 3+155-155-1=0+0+0+1
*if(now()=sysdate(),sleep(15),0)
0'XOR(
*if(now()=sysdate(),sleep(15),0))XOR'Z
0"XOR(
*if(now()=sysdate(),sleep(15),0))XOR"Z
(select(0)from(select(sleep(15)))v)/*'+(select(0)from(select(sleep(15)))v)+'"+(select(0)from(select(sleep(15)))v)+"*/
-1
-1)
-1 waitfor delay '0:0:15' --
FvQOc2w5'
-1 OR 42=(SELECT 42 FROM PG_SLEEP(15))--
-1) OR 54=(SELECT 54 FROM PG_SLEEP(15))--
-1)) OR 203=(SELECT 203 FROM PG_SLEEP(15))--
G8o5lKzS' OR 760=(SELECT 760 FROM PG_SLEEP(15))--
kbP9f51y') OR 646=(SELECT 646 FROM PG_SLEEP(15))--
MISJn3E0')) OR 424=(SELECT 424 FROM PG_SLEEP(15))--
*DBMS_PIPE.RECEIVE_MESSAGE(CHR(99)||CHR(99)||CHR(99),15)
'||DBMS_PIPE.RECEIVE_MESSAGE(CHR(98)||CHR(98)||CHR(98),15)||'
'"
����%2527%2522\'\"
@@o29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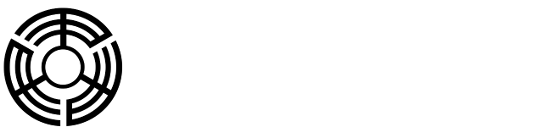
PoP67j5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