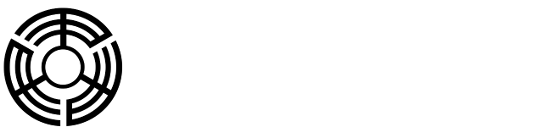| 윤선거묘표 | |
| root | 2020.08.26 07:37 | |
|
有明朝鮮徵士 魯西先生 坡平尹公宣擧之墓 配公州李氏祔左 有明朝鮮故徵士魯西先生坡平尹君宣擧吉甫卒。 惟我一二兄弟尙在。無以寓後死之悲。相與略敍其志行。而書之于石。以表其墓曰。 君卽我仲父八松府君之季子。牛溪成先生之外孫也。 自幼寡言笑嗜欲。學于家庭。博通群書。弱冠遊國庠。士論咸加推重。 崇禎丙子春。金虜僭號以使來。君慷慨再倡多士伏闕。請斬之。 冬。又上書江都分司。責以偸安之罪。聞者竦動。 丁丑。八松公以斥和議。首被謫。君自此屛居丘園。專心學問。從遊金愼齋諸公間。 晨必正衣冠。危坐終夕。俯讀仰思。未嘗須臾息。 孝宗卽位。公卿交薦。卽拜諮議。君以臨亂不死。引咎不就。其後累以持平掌令進善徵不置。 至戊戌春。遂自載至京。上五疏陳情而歸。時上必欲致之。至命以士服入對。君竟辭不敢當。 今上朝。復除執義司業,元子講學官。及因災。別諭者前後凡十數。亦不起。 己酉三月。上幸溫泉。君辭召於中路。還家疾作。 以四月十八日終。年僅六十。士林莫不涕洟相弔。 訃聞。上驚悼。恨不得一見。命所在。歸賻尤葬。特贈吏曺參議。 君器度弘毅。容貌嚴恭。愼而能斷。剛而善恕。孝悌忠信。通明公正。 其學一以主敬窮理克己躬行爲主。精密篤確。體用俱備。蓋自坡山法門。以上溯閩,洛。淳如也。逮其晩節。德積行成。和順輝光。宗黨仰其仁。鄕隣服其化。朋友信之。學者尊之。猶欿然有不自足之意。以沒其身焉。 所著易後天說,家禮源流等書。深有所發揮。至論時務。常曰。今天下之陰陽易位。一國之邪正同流。士苟有意。其義固無大於尊攘。亦未有不先定內而能此者。蓋亦非空言也。 嗚呼。簞瓢縕袍。樂以忘憂。俛焉孜孜者。必有所好矣。旌招側席。禮貌愈加。礭乎不可拔者。必有所守矣。人徒見其壁立萬仞。而及其所以深造自得者。鮮克測知。遂至經綸之略。屈於當世。德行之懿。殉乎一身。天之生此人。果何爲哉。然而承繼父師。體正學明大義。屹然爲斯文世道之重。以俟百世而無惑者。固不以行藏有間。則於君又何憾焉。 配公州李氏。生員長白之女。貞正英秀。曉達經史。有古烈女風。江都之難。聞城陷。卽引決。 君葬于交河縣月籠山向酉之原。孺人祔其左。 男長拯。次推。女適朴世厚。又有撥,拙,挹。側室子也。 拯生二男。行敎,忠敎。一女。未行。 推生二男。自敎,可敎。 時崇禎紀元之後四十三年庚戌十月癸巳。從兄元擧。述。季兄文擧書
유명조선(有明朝鮮) 징사(徵士) 노서선생(魯西先生) 파평(坡平) 윤공(尹公) 선거(宣擧)의 묘
배(配) 공주(公州) 이씨(李氏)가 왼쪽에 부장하다. 유명조선(有明朝鮮) 징사(徵士) 노서선생(魯西先生) 파평윤군(坡平尹君) 선거(宣擧) 길보(吉甫)가 졸하였다. 생각건대 남아있는 우리 열두 형제는 그의 죽음 후 함께할 수 없음을 슬퍼하며,
함께 상의하여 그의 뜻과 행동을 서술하고 돌에 새겨 그의 묘임을 표시하려 한다. 군은 곧 우리 중부(仲父) 팔송부군(八松府君)의 막내 아들이고 우계(牛溪) 성혼선생의 외손(外孫)이다. 어려서부터 말하고 희희덕 거리고 욕심부리는 것이 적었으며 가정에서 배워서 여러 책들을 널리 읽었다. 약관의 나이에 성균관으로 가서 공부하니 선비들이 모두 추중(推重)해야 한다고 의논하였다. 숭정 병자년 봄에 청나라 오랑캐들이 참람되게도 사신을 보내 오니 군이 비분강개하며 두 번 창기하였으므로 많은
선비들이 대궐에 엎드려서 그 사신을 베기를 청하였다. 겨울에 또 상서하기를 강도분사에서 그저 편안함을 도모했다는 죄를 책임지겠다고 하니 듣는 사람들이 너무 황송하여
몸이 떨었다. 정축년, 팔송공이 척화(斥和)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유배를 갔는데, 군도 구원에 은거하여 학문에
오로지 마음을 쏟아 김진이(金眞爾) 등 여러 공들에게 종유(從游) 하였다. 군은 신중하기를 반드시 의관을 똑바로 하고 하루 종일 꼿꼿이 앉아서 늘 독서하고 사색하기를 조금이라도 쉰 적이
없었다. 효종이 즉위하였을 때, 공경들이 서로 추천함에 자의(咨議)에 제수하였으나, 군은
난을 당하여 죽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의 허물로 여겨 나아가지 않았다. 그 뒤에도 자주 지평(持平)이나 장령(掌令) 등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무술년 봄에 이르러 드디어 서울에 이르러 다섯 차례의 상소로 진정하였고 돌아갈 때 상은 지극한 명을 내려 사복(士服)을 입고 입대(入對)하라고 하였으나 군은 마침내 사양하고 감히 하지 못하였다. 금상(今上)께서 다시 집의(執義), 원자강학관(元子講學官) 등의 벼슬을 제수하신 것이 재이(災異)로 인한 별유(別諭)로
말미암아 앞뒤로 모두 십여 차례였지만 또한 나아가지 못하였다. 기유년 3월에 상께서 온천에 행행하시니 군이 중로(中路)에서 부르시는 것을 사양하였다. 4월 18일에 죽었는데
나이 60세이다. 사림 중에서 눈물을 흘려 슬퍼하며 서로
위로 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부음이 전해지자 임금은 한번도 볼 수가 없음을 한스럽게 생각하고, 관청에
명하여 부의가 돌아가는 길에 장례에 더하게 하고, 특별히 이조참의(吏曹參議)를 추증하였다. 군은 기국이 넓고 꿋꿋하고 용모가 엄숙하고 공손하며 신중하고 용단할 줄 알며 굳세고 관용할 줄 알았다. 그리고 효제충신(孝悌忠信)하고
통명공정(通明公正)하였다. 그의 학문은 오로지 경을 위주로 하여 이치를 궁구하고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여 몸소 실천하여 정밀하고하고 독실히
확신하는 것으로 오로지 하여 체용(體用)이 다 갖추어져 있다. 대개 파산법문(坡山法門) 이상으로부터
민낙(閩洛)의 순여(醇如)함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절개를 좋아하고 덕이 쌓여 행동이
온화하하여 그 후광이 종당에 비우허 사람들이 그의 인향을 우러르고 이울사람들이 그의 교화에 탄복하여 붕우들은 그를 믿고 학자들은 그를 믿기를 겸연히
부족한 분이 있기를 그의 몸이 죽을 때까지 하였다. 그가 지은 역후천설(易後天說)과
가례원류(家禮源流) 등의 책에는 깊이 발휘하는 바가 있었고
시무(時務)를 논하는데 이르러서는 늘 “오늘날 천하의 음양이 자리를 바뀌어 ~마멸~하늘은 존왕양이(尊王攘夷)에
대해서도 아직 정하시지 않은 바가 없다.”고 하니 대개 빈 말이 아니다. 오호라. 한 소쿠리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로도 즐거워 근심을 잊고
묵묵히 힘썼으니 필시 좋아하는 바가 있었고 정(旌)으로 옆
자리로 불러 예모를 더욱 더하였지만 확고히 그의 신념을 꺾을 수 없었으니 필시 지키는 바가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가 만길 낭떠러지에 서있는 것만을 볼 뿐이고 그가 깊이 나아가 스스로 터득한 것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이가 드물다. 경륜의 대략은 당세 덕행의 아름다움으로 일신에 순절하는 것보다 못하다. 하늘이 이 사람을 낳은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 아버지와 스승을
계승하고 학문과 대의를 본받아 우뚝이 사문의 세도가 되었으니 백세를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의혹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진실로 행동에 차이가 없을 것이니 군에 대해서도 무슨 유감이 있겠는가. 배위는
공주이씨(公州李氏) 생원(生員) 장백의 딸로서 올곧고 빼어나며 경사에 정통하고 옛 열녀의 기풍이 있었다. 강도(江都)의 난에 성이 열리고 함락되자 곧 인결(引決)하였다. 교하현(交河縣) 월롱산(月籠山) 향유(向酉)의 군의 장례를 치렀는데 유인도 합장하였다. 장남은 증(拯)이었고 차남은
추(推)였으며 딸은 박세후(朴世垕)에게 시집갔고 또 발(撥), 졸(拙), 읍(挹)이 있는데 모두 측실의 아들들이다. 증(拯)은 아들 둘을 낳았는데
행교(行敎)와 충교(忠敎)이고 딸 하나를 낳았는데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다. 추(推)는 아들 둘을 낳았는데
자교(自敎)와 가교(可敎)이다.
숭정(崇禎) 기원후 43년(현종 11, 1670년) 경술년 10월 계사일에 종형(從兄) 원거(元擧)가 찬술하고 계형(季兄) 문거(文擧)가 글씨를
썼다. |
|
| 이전글 | 윤비경(尹飛卿)의… | 尹士昕 神道碑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