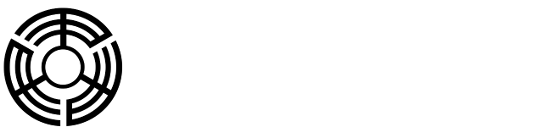| 윤비경(尹飛卿)의 비명(碑銘) - 송시열(宋時烈) | |
| root | 2020.08.26 07:23 | |
|
파평 윤씨는 우리나라의 대성(大姓)이다. 고려의 태사(太師) 휘(諱) 신달(莘達)로부터 이름난 정승과 높은 관직에 있었던 분들이 족보에 실려 있다. 소정공(昭靖公) 파평군(坡平君) 휘 곤(坤)에 이르러
우리 태종(太宗)을 섬겨 좌명 공신(佐命功臣)에 책록되면서 시호(諡號)를 열었다.
고조부 휘 응규(應奎)는
첨정(僉正)을, 증조부
휘 인함(仁涵)은 형조 참판을, 조부 휘 홍립(弘立)은
전적(典籍)을 지냈는데, 이분이
휘 유건(惟健)을 낳으매 학문과 덕행이 크게 있었으나 세상이
어지러움을 만나자 스스로 출세를 폐기하여 침몰하였으므로, 식자들이 지금에 이르도록 애석해 한다. 어머니 권씨(權氏)는
직장(直長) 권급(權級)의 딸이었다.
공은 만력(萬曆) 정미년(丁未年, 1607년 선조 40년)에 태어났다. 휘(諱)는 비경(飛卿)이며 자(字)는 충거(冲擧)이다. 어렸을 때부터 그릇의 크기가 보통 아이들과 달라 사람들이 장차
윤씨 가문을 크게 빛내리라고 생각하였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모부인(母夫人)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부지런히 글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갔다. 일찍이 참판 이민구(李敏求)를
좇아 배웠는데, 인하여 그의 아버지 지봉공(芝峯公, 이수광(李晬光))을 배알하자
지봉공이 사랑하여 가르치면서 매양 그 과작(課作)을 볼 때마다
반드시 칭송하기를, “기재(奇才)로다. 기재로다.” 하였다.
27세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해 태학(太學)에
들어가서 재임(齋任)이 되었는데, 하는 말이 간결 신중하고 논의가 명백하였으므로 사우(士友)들이 모두 추천하여 순릉(順陵)의
재랑(齋郞)이 되었으나 얼마 있지 않아 사직하고 돌아왔다. 경인년(庚寅年, 1650년
효종 원년) 겨울에 대과(大科)에 급제하고 괴원(槐院)에
뽑혀 들어갔는데, 실록(實錄) 편찬에 참여한 노고로 인해 저작(著作)을 거쳐 박사(博士)로
승진하였고, 천거로 승정원(承政院)에 들어 주서(注書)가
되었다가 관례대로 옮겨져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이 되었으며, 평안도 도사(平安道都事)로
나갔다가 교체되어 들어와 병조 좌랑(兵曹佐郞)이 되었고 또
외직으로 나가 전주 판관(全州判官)을 지냈다. 이듬해에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이
되었다가 친병(親病)으로 교체 면직(免職)되었으며 연서도 찰방(延曙道察訪)으로 좌천되었는데, 대체로 정언(正言)으로 있을 때에 저지른 조그마한 실수로 연좌된 것이었다.
조정에 들어와 지평(持平)이
되었는데, 공훈을 세운 재상의 사나운 첩실(妾室)이 그 집안에 흉포하게 굴므로 공이 발론(發論)하여 체포해 치죄하니, 여러 사람이 그 논의를 명쾌하게 여겼다. 이로부터 양사(兩司)를
떠나지 않았으며, 간혹 다른 관직에 임명함이 있었어도 도로 양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일찍이 성지(聖旨)에
응하여 진언(進言)함에 있어 위로는 군주의 덕으로부터 아래로는
조정 모든 집사(執事)에 이르기까지 그 시비 득실에 관해
극력(極力)으로 말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또 각 관아의 둔전(屯田)과
여러 궁가(宮家)의 절수(折受)를 혁파하라고 청하는 한편 세자를 보좌 교도하는 일 및 궁중의 단속을 엄숙히 하라는 등의 일에 대하여 더욱 정성껏
말하였는데, 그 후에 여러 왕손들이 자유로이 드나들어 종묘사직이 거의 위태로울 뻔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공의 선견지명에 감복하였다.
기해년(己亥年, 1659년
효종 10년)에 효종 대왕(孝宗大王)이 승하하자 대왕대비의 복제(服制)가
기년(朞年)으로 결정되었는데, 윤선도(尹善道)가 상소하여
터무니없이 모함하며 ‘종통(宗統)이 명확하지 못하고 군지(群志)가
정해지지 않았다’고까지 하였으므로, 위망(危亡)의 화가 아침 저녁에 닥쳐와 임금의 들음을 두렵도록 동요시켰다. 공은 당시에 헌직(憲職)에
있으면서 그 지어낸 의도의 음험함을 마음 아프게 여겨 이에 동료들과 의논해서 윤선도를 파면시키고 귀양 보낼 것을 아뢰었는데, 당시의 의론은 ‘윤선도가 사람을 반역으로 무고하였으니, 당연히 반좌(反坐)의
법을 적용해야 된다면서 형률을 더해 처단함이 마땅하다’ 하였으므로, 공이
이러한 논의로써 아뢰어 비록 윤허는 받지 못하였으나 여러 사람의 평판은 옳게 여겼다.
그 후에 한 재상이 윤선도를 감싸주어 ‘윤선도는 효종을 위해 좌단(左袒, 편을 듦)하였다’ 말하면서 그 뜻이 윤선도에게 깊이 있었으므로 대신(臺臣)들이 논계(論啓)하여 죄
주기를 청하였다. 그런데 한두 명의 대신(大臣)이 그 사이에서 주저하며 결정을 짓지 못하는지라 공이 집의(執義)로서 대신들을 아울러 배척하였다. 임금이 특별히 엄지(嚴旨)를 내리며 대단히 진노하였으나 대신의 말에 힘입어 견책 처벌을
면하게 되었는데, 후에 임금이 경연에서 말하기를, “윤모(尹某)의 말이 정직한 것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특별히 말이 대신(大臣)에게
관련되기 때문에 부득불 대신의 입장과 함께 했을 따름이다.” 하였다.
이로부터 여러 번 사헌부의 관직에 의망하였지만 끝내 임금의 낙점(落點)을 얻지 못하였다.
효종 대왕을 부묘(祔廟)할
때 독축관(讀祝官)이 되었으므로 관례에 따라 통정 대부(通政大夫)에 올라 동부승지(同副承旨)가 되었다가 순서대로 우부승지(右副承旨)가 되었는데, 부모 봉양을 위해 외직을 청원하여 통진 현감(通津縣監)이 되었다. 당시에
조정에서 백성의 토지를 측량했는데, ‘공은 백성의 기쁨과 걱정, 부역(賦役)의 가볍고 무거움이 모두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몸소 돌아다니며 점검하여 전적으로 토지의 기름지고 메마른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겼으므로, 백성들이 매우 편리하다고 여겼다. 대부인(大夫人)의 병환이 있자 의원과 약품의 편리를 위해 관직을 버리고 서울
집으로 돌아가는데, 고을 백성들 노소(老少)가 길을 막고 눈물을 떨구며 “어찌 우리를 버리고 가십니까?” 하였다.
잠시 은대(銀臺, 승정원(承政院))에 들어 승지(承旨)가 되었는데, 마침내 어머니의 상(喪)을 당하였다. 이때 공의 나이가 훼척(毁瘠)해서는 안될 때에 다다랐는데도 여막(廬幕)에 거처하고 죽을 먹으며 한결같이 예식(禮式)을 따르자, 보는
사람이 위태롭다고 여겼다. 복(服)이 끝나고 은대와 여러 조(曹)의
참의로 두루 이동하였다. 어느 권세 있는 신하가 조그마한 일로써 터무니없는 사실을 꾸며 무함하였으므로
연루되어 파직 당하였다가 다시 서용(敍用)되어 공조 참의가
되었고 이어서 경주 부윤(慶州府尹)과 회양 부사(淮陽府使)에 제수되었는데, 공은
모두 부임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회양은 지역이 궁벽하고 업무가 단촐해서 이은(吏隱, 관직에 있으면서 은자(隱者)처럼
지내는 것)할 만하다고 여겨 마침내 부임하였다. 임기가 차서
교체될 때는 금상(今上, 숙종)께서 즉위하신 갑인년(甲寅年,
1674년 현종 15년)이었는데, 적신(賊臣) 윤휴(尹鑴)가 권세를 잡고서 방자하게 횡포하면서 일찍이 윤선도가 흉패(凶悖)하게 된 것을 가지고 이때에 이르러 그 죄명(罪名)을 뒤따라 씻어주어 높은 관직을 추증(追贈)케 하고, 또 전에
윤선도를 논한 대간(臺諫)들을 죄줌에 있어 공을 우두머리로
삼았다. 공이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다.” 하였는데, 마침 윤휴와 허적(許積)의 무리 중에 역시 공과 함께 일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은 중지되었다. 경신년(庚申年, 1680년 숙종 6년)에 여러 흉폭한 무리가 복주(伏誅)되자
임금이 여러 훈신(勳臣)과 더불어 단에 모여서 맹서하였는데, 공은 파평공(坡平公, 윤곤)의 적장(嫡長)으로 참여하였다. 이에 가선 대부(嘉善大夫)의
품계에 올라 호조 참판이 되고 봉호(封號)를 이어받았다. 공은 일시 굴욕을 당하였다가 바야흐로 신설(伸雪)되었으나 몸은 이미 병들었으므로, 마침내 그해 12월 29일에 서울 자택에서 세상을 떠나니 향년 74세였다.
부인 이씨(李氏)는 목은(牧隱) 문정공(文靖公, 이색(李穡))의 후손으로
좌랑 이구연(李九淵)의 딸이다. 공이 거상(居喪)할 때에
여막(廬幕)에 불이 나자 부인은 공이 탈출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불속으로 몸을 던져 죽었는데, 이 일이 알려지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였다. 포천군(抱川郡) 고곡리(古谷里) 유좌(酉坐)의 묘원에 광중은 따로 하여 공과 함께 묻혔다. 3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
윤명우(尹明遇)는 통정 대부(通政大夫)로 현감을 지냈고, 차남
윤명운(尹明運)은 능참봉(陵參奉)이고, 삼남은 이명원(李明遠)이며, 딸은 찰방 송기학(宋基學)에게 시집갔다. 현감의 아들은 윤봉의(尹鳳儀)이고 세 사위는 김형수(金衡壽)ㆍ고도원(高道源)ㆍ송강석(宋康錫)이다. 참봉의 아들은
윤봉휘(尹鳳輝)ㆍ윤봉위(尹鳳威)ㆍ윤봉기(尹鳳蘷)이다. 윤명원의 아들은 윤봉소(尹鳳韶)ㆍ윤봉조(尹鳳朝)이고, 1녀는 아직
시집가지 않았다. 송기학의 아들은 송종석(宋宗錫)이며 두 딸은 신상동(辛相東)과
박흠(朴欽)에게 시집갔다.
공은 유명한 가문의 자제로서 일찍이 영예(英譽)를 드날렸고 또 내부적인 품행을 모두 갖추었다. 그러나 항상 담박하여
스스로 지키면서 교유(交遊)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등용되었다 버려졌다 하는 사이에 있었으며, 말년에 이르러서는 나아갈 길이 바야흐로 열렸는데도 갑자기
그해에 생을 마치게 되었으니, 어찌 운명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나
사화(士禍)가 창궐할 때를 당해 폐출되어 두려워서 몸을 움츠렸고
간당이 주륙 당하자 작위가 높아져 영달하였으므로 공의 진퇴는 바로 세상의 도의와 함께 쇠퇴하고 융성하였으니, 공의
어짐은 말하여 설명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명백하다.
공은 나보다 6개월 연장이며 또 두 집안이 통혼(通婚)한 친분으로 정의가 더욱 돈독하니, 이제 신도비명(神道碑銘)을
지음에 의리상 사양할 수 없었다. 다음과 같이 명(銘)을 쓴다.
윤씨는 동방에서 옛부터 지체가 높은 가문으로, 그 지류(支流)가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혹은 시내로 혹은 강으로 흐른 듯하네. 오직 소정공(昭靖公, 윤곤)의 가계를 공이 진실로 이었으니, 나무에 근간(根榦)이 있어 가지가 무성함과 마찬가지이다. 공은 처음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갈 길이 바야흐로 열렸었는데, 공은
고요함을 지켜 달려가서 쫓음을 즐겨하지 않았네. 고개를 숙이고 배회하며 나약한 사람처럼 지내다가, 대각(臺閣, 사헌부와
사간원)에 오름에 미쳐 분변하고 막으며 간청함이 굳세었도다. 현종(顯宗) 초에 사화(士禍) 시작되자 공은 우물쭈물하지 않고 그 곧음이 화살 같았네. 악인(惡人)의 우두머리 움츠리고 그 포악함을 펴지 못하자, 사류(士類)들이 간신히
용납되어 여윈 돼지 경박하게 날뛰려는 것 방비했는데, 갑인년(甲寅年, 1674년 숙종 즉위년)ㆍ을묘년(乙卯年, 1675년 숙종 원년)에 여러 흉도들 대단히 간특하여, 천지(天地)를 일망타진하려고
형틀을 씌워 귀양 보내 가두었네. 그들 성냄을 공에게 쌓아 그 흔단을 다투어 꾸미어, 처음에는 중형(重刑)이
가해질 듯하였고 나중에는 사형까지 당할 뻔하였는데, 공은 운명이 하늘에 있다면서 태평한 마음으로 괴로워하지
않았도다. 임금께서 총명하시어 소인(小人)들 연이어 죽음을 당하였도다. 공의 관직 회복시켰고 공의 직질(職秩) 승진시켰으며, 봉군(封君)의 호 물려받아 이에 선조의 공로로 작위(爵位) 누리게 되자, 공은
배사(拜謝)하며 말하기를 이는 신의 힘으로 이룬 것 아니고, 요순(堯舜) 같으신 임금님
만나 은총의 영광 지극하심이라 하였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늙은이의 큰 뜻 바치리라 기대했는데,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 일찍이 품었던 뜻 연기처럼 가라앉았네. 고곡리(古谷里)의 한 무덤 공의 체백(體魄) 묻힌 곳에, 내가 묘도(墓道)의 비명 써서 영원토록 드러내어 보이노라. |
|
| 이전글 | 윤사로(尹師路)의… | 윤선거묘표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