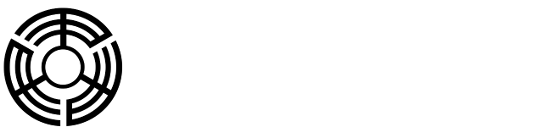| 재상지종(宰相之宗) | |
| root | 2020.08.24 07:11 | |
|
충선왕 즉위 교서 지금부터 만약에 종친(왕족)으로서
동성(同姓)과 혼인하는 자는 (원 세조의) 성지(聖旨)를 어긴 것으로 논죄할 터인즉, 마땅히 종친은 누세(累世)에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을 아내로 맞아야 하고, 재상 집안의 아들은 종실의 딸에게 장가들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에
가세가 미미한 자는 이 제한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신라의 왕손인 김혼 일가는 역시 순경 태후의 숙백
집안이며, 언양 김씨 일종과 정안 임태후 일종, 경원 이태후와
안산 김태후 및 철원 최씨․해주
최씨․공암
허씨․평강
최씨․청주
이씨․당성
홍씨․황려
민씨․횡천
조씨․파평
윤씨․평양
조씨는 모두 누대 공신이요, 재상지종(宰相之宗)이니 가히 세제로 혼인을 하여, 이들은 종실의 여자에게 장가를 들고
딸은 비로 삼을 만하다. 문무 양반가도 동성 간에는 결혼하지 못하나 외가 4촌 간은 구혼을 허용한다. <고려사> 출처:[고려사 권제33, 24장
앞쪽~뒤쪽, 세가 33 충선왕 복위.11 (원문)彦陽金氏一宗定安任太后一宗慶源李太后安山金太后鐵原崔氏海州崔氏孔岩許氏平康蔡氏淸州李氏唐城洪氏黃驪閔氏橫川趙氏坡平尹氏平壤趙氏
並累代功臣宰相之宗可世爲婚
권문세족의 집권 고려
후기에 정치권력을 장악한 것은 권문세족이었다. 이들은 1백여년간에 걸친 무신정권과 그 뒤 대원관계가 진전되는 가운데
재편성된 사회세력으로서, 여기에는 여러 유형이 포함되어 있었다. 먼저
무신정권기에 새로 부상한 무반세력이 권문세가에 편입되었다. 무신정권은 몰락하였지만 무신정권기에 대두한
무반세력은 왕정이 복구된 뒤에도 유력한 가문으로 등장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은 김취려(金就礪)의 언양김씨(彦陽金氏)와 채송년(蔡松年)의 평강채씨(平康蔡氏)를 들 수 있다. 고려
후기에 권문세가로서 무반가문의 등장은 고려 전기에 문벌귀족이 문반가문으로만 구성된 것과는 크게 다른 점이었다. 고려 후기의 권문세가가 된 또 하나의 새로운 세력은 원나라와의 관계를 통하여 대두한 가문이었다. 몽고어의 역인으로 성장한 조인규(趙仁規)의 평양조씨는 그 대표적인 가문이었다. 응방(鷹坊)을 통하여 진출한 윤수(尹秀)의 칠원윤씨(漆原尹氏)와
삼별초의 난과 일본정벌에서 무공을 세워 출세한 김방경(金方慶)의
안동김씨 등은 원나라와의 관계를 통하여 대두한 지배세력이었다. 이와 함께 고려 전기의 문벌귀족도 그대로 지배세력으로 존속되었다. 인주이씨나
정안임씨·경주김씨·파평윤씨 등 전통있는 문벌귀족이 고려 후기에도
여전히 권문세가로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는 고려사회의 뿌리깊은 문벌관념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들 문벌귀족의 전통적인 권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정치권력은 크지 못했다는 것이 권문세가의 새로운 성격이라
하겠다. 충선왕 즉위년의 하교에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재상지종(宰相之宗)이 열거되고 있어 주목된다. 여기에는 경주김씨·파평윤씨·언양김씨·인주이씨·안산김씨·철원최씨 등 열다섯 가문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문벌귀족과 무신란 뒤에 새로 진출한 무반가문, 그리고
대원관계를 통하여 대두한 세력들이다. 이들 가운데에는 당시 세력은 별로 강력하지 못하였으나 전기 이래로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은 가문이기 때문에 열거된 경우가 있고, 반대로 상당한 실력은 가졌지만 전통적인
문벌관념에 의하여 빠진 가문도 있었으나, 이들 재상지종은 대체로 고려 후기의 지배세력인 권문세가를 가리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권문세가는 고려 후기의 지배 세력으로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정치권력을 장악하였는데, 이들은 첨의부와 밀직사의 재추(宰樞)가 되었고, 도평의사사에 참가하여 국정을 맡아 보았다. 처음 도병마사에는 재신 5명 추신
7명이 합좌하였으나, 후기에 도평의사사로 기구가 확대되면서 70∼80명에 이르는 재추가 회의에 참가하고, 그 기능은 최고의 정치기관으로
대두하여 도당(都堂)이라 불리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대토지의 소유자였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관리에게
주는 녹과전이나 녹봉보다는 불법적인 토지집적을 통하여 이룬 농장(農莊)을
경영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이 농장은 면세와 면역의 특권 등 사적 지배력이 강한 토지였는데, 권문세가는 산천을 경계로 하는 광대한 농장을 소유하였다. 이와 같이, 후기의 권문세가는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광대한 농장을
경영하는 지배층으로 보수적인 사회세력이었다. 이들은 문화적 소양과는거리가 먼 성향을 가졌고, 대체로 친원적인 존재들이었다. 따라서 권문세가는 기성의 정치권력을
유지하고, 경제기반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원나라의 세력을 이용하고, 새로운
개혁을 반대하였다. 후기의 권문세가가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재상지종으로 문벌을 중요시한 점은 전기의
문벌귀족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그 성분부터 그와 다른 데가 있었다. 무반가문이나
부원세력 등 종래의 문벌관념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세력이 편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종래의
문벌귀족이 가문 자체의 권위로 귀족적 특권을 누린데 반하여, 권문세가는 현실적인 관직을 통하여 정치권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그 관료적 성향이 농후하였으며, 고려의 지배세력은 가문위주의 문벌귀족에서 보다 관료적
성향이 짙은 권문세가로 발전하여 갔다. |
|
| 이전글 | 문벌귀족 | 윤탁과 성균관 은…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