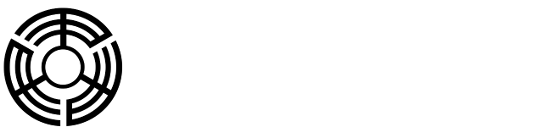| 진찬의(陳饌儀) - 坡平尹氏大宗中 홀기(笏記) | |
| root | 2020.08.18 07:43 | |
|
진찬의(陳饌儀) - 坡平尹氏大宗中 홀기(笏記)에 依함 -
진찬의는 제수를 제상에 진설하는 예의를 말함. 진찬의를 세일사(歲一祀) 때는 홀기(笏記)를 집례자(執禮者)가 읽고 집사자(執事者)가 이에 따라 진설하나 기제(忌祭) 때는 읽지 않고 집사자가 진설함도 가함)
궐주인이하서립(궐主人以下序立) 주인은 제주(祭主) 즉 큰아들, 장손을 말함이고 서립이란 신위 앞에 차례로 선다는 뜻이다. 장손이 없거나 불참시는 가장 가까운 사람 즉 차자, 질(姪)이 대행하며 歲一祀에서는 연고행고(年高行高)로 보아 가장 장자가 행한다.
어시행진찬(於是行進饌) 이제부터 제수를 제상에 올림
주인솔집사자관세(主人率執事者관세) (대야 관. 수건 세) 주인이 행사의 보조자인 집사자를 데리고 손을 씻는다.
설포헤과품어제상남단제1행(設脯醯果品於祭床南端第1行) (헤는 옛발음으로 해(젓갈)을 말함) 果品은 丙舍祭儀에는 五色으로 되어 있으나 가정형편에 따라서는 三色으로 쓸 수 도 있다. 色이라 함은 가지 數를 말한다. 제상은 北向하여 진설함이 원칙이나 형편에 따라 진설 할 수 있다. 다만 동쪽은 제주의 오른쪽, 서쪽은 제주(祭主)의 왼쪽, 남쪽은 제주의 바로 뒤쪽, 북쪽은 신위를 모신곳으로 알면 된다.
포재서(脯在西) 포(마른 명태(明太)나 가조기)를 먼저 제1행 서쪽에 진찬한다.
차 조(次 棗) 포 다음에 대추를 진찬한다.
차 율(次 栗) 대추 다음에 밤을 진찬하는데 생율(生栗), 또는 찐밤(熟栗)을 쓴다.
차 시(次 枾) 감은 홍시 또는 乾枾(곶감)을 쓴다.
차 건정과(차 乾正果) 감 다음에 마른과자를 쓰는데 없으면 안 쓸 수 도 있음.
차 수정과(次 水正果) 없으면 안 쓸 수 도 있음.
차 이(次 梨) 수정과 다음에 배를 쓴다.
차 호도(次 胡桃) 배 다음에 호도를 쓰나 없으면 사과 밀감으로 대용한다.
차 다식(次 茶食) 다식은 없으면 안 쓸 수 도 있음.
차 식혜(次 食醯) 식혜는 맨 앞줄 맨 끝이 된다.
설반상어제이행(設盤床於第二行) 반상은 채소상을 말함이고 2행은 果줄의 뒷줄이 됨.
숙채재서(熟菜在西) 숙채는 볶은 나물인 바 무, 배추, 고사리, 도라지 등을 말한다.
차 생채(次 生菜) 생채를 숙채 다음에 씀은 丙舍祭儀이며 선인들은 생채를 침채(沈菜 김치) 다음에 쓰기도 하였다.
차 초장(次 醋醬) 간장에 초를 타서 쓴다.
차 청장(次 淸醬) 간장을 말한다.
차 침채(次 沈菜) 물김치를 말한다.
차 해의(次 海衣) 김을 말한다.
차 어혜(次 魚醯) 젓담은 조기인데 김 다음이며 제2행 맨 끝이다.
설시저잔반어북단(設匙箸盞盤於北端) 시저는 숟가락, 젓가락. 잔반(술잔대) 북단 신위 바로 앞줄에 진설한다.
시저접거중 잔재좌우(匙箸접居中 盞在左右) 시저접은 숟가락, 젓가락을 놓는 그릇인데 한가운데 진설하고 술잔대를 좌우에 놓는다.
설간남어반상지북간행(設肝南於盤床之北間行) 간남은 갈납이며 갈납줄은 북간행 즉 채소줄의 뒤이며 탕줄의 앞줄이다.
숙육재서(熟肉在西) 숙육은 쇠머리고기를 삶아서 눌러 썰은 것인데 수육이라 하기도 한다. 주인의 왼쪽이다.
차 육전(次 肉煎) 육전은 고기를 부친 것이다.
차 회간(次 膾肝) 회간은 소의 간이며 육전의 다음에 쓴다.
차 어전(次 魚煎) 어전은 생선을 부친 것이다.
차 해삼(次 海蔘) 해삼은 무이를 말하며 해삼을 쪄서 계란으로 싸는 것인데 근래는 두부를 계란으로 싸서 쓰는 수가 있으나 이는 元禮가 아니다.
차봉육어탕전우남단제삼행(次奉肉魚湯奠于南端第三行) 탕은 즉 찌개라고 할 수 있다. 제3행은 갈납줄의 뒷줄이니 줄수는 넷째줄이 된다. 갈납줄은 間行으로 치므로 탕 떡줄이 제3행이 된다.
육탕재서(肉湯在西) 육탕은 쇠고기로 만든 탕이고 왼쪽 첫 번째 이다.
차 양탕(次 양湯) 소의 양으로 만든 탕인데 육탕 다음에 쓴다.
차 계탕(次 鷄湯) 닭고기 탕인데 양탕 다음에 진찬한다.
차 어탕(次 魚湯) 생선으로 만든 탕이며 닭탕 다음에 진찬한다.
차 홍합탕(次 紅蛤湯) 홍합을 익혀서 만든 탕이며 어탕 다음에 진찬한다. 탕에 대해서는 5색으로 정해졌으나 형편에 따라서는 3색이나 단색으로 쓸 수도 있지만 考, 비位 合設하는 제사에는 兩位에 각각 진찬함이 元禮이다. (비位에서 비는 "죽은 어미 비"자를 쓴다)
차 봉병면전지(次 奉餠麵奠之) 떡과 면을 말함이니 考, 비位 合設 때는 각각 진찬하는 바, 先人의 말씀에 단 한 접시만 써도 失禮는 아니라 하였다.
병동면서(餠東麵西) 떡은 오른쪽에, 면은 왼쪽에 진설한다.
차 병채병밀(次 餠菜餠蜜) 병채는 나물을 초에 무친 것인데 떡접시 앞 왼쪽에 쓰고, 병밀을은 꿀이며 그 오른쪽에 쓴다.
차봉반갱전우제사행(次奉飯羹奠于第四行) 밥과 국을 말하며 제4행은 시접줄이며 메를 주인의 왼쪽, 국을 오른쪽에 진찬한다.
차봉적전우탕병지간(次奉炙奠于湯餠之間) 적을 말함인데 탕줄 한가운데에 진찬한다. |
|
| 이전글 | 제사(祭祀)의 종… | 시호(諡號)는 어… | 다음글 |